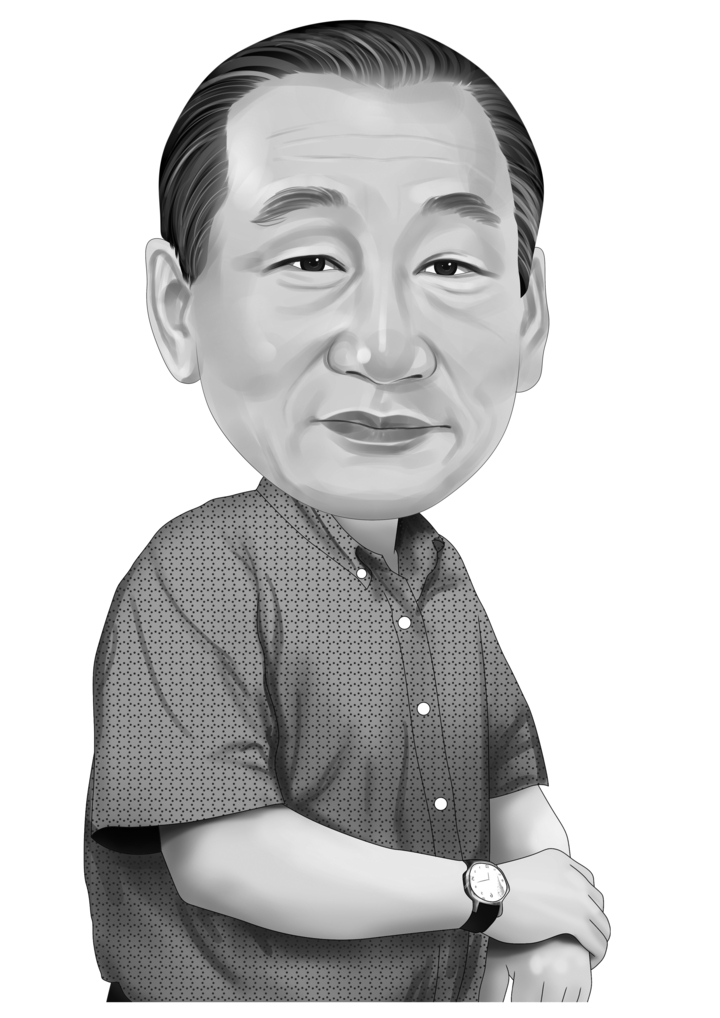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Choral; Ode de Joy) 감상이 연말의 통과의례 1순위라지만, 고전음악 팬 중에는 헨델의 메시아를 선호하는 사람도 많다. 한 해에 종지부를 찍는 장중한 마감의 의미가 뚜렷하니까. 아이들이 한창 자라던 90년대에,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발레 호두까기 인형을 그믐날에는 영화 벤허를, 온 가족이 둘러앉아 레저 디스크로 감상하였다. 영화가 끝나고 함께 카운트다운을 하며 듣던 제야의 종소리를 아이들은 지금도 얘기한다. 당시에는 귀하던 소니 40인치 HD TV에 Bose 901 등 스피커 여섯 개를 연결하여 서라운드로 듣던 추억을... 지금은 얼마나 좋아졌는가?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Choral; Ode de Joy) 감상이 연말의 통과의례 1순위라지만, 고전음악 팬 중에는 헨델의 메시아를 선호하는 사람도 많다. 한 해에 종지부를 찍는 장중한 마감의 의미가 뚜렷하니까. 아이들이 한창 자라던 90년대에,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발레 호두까기 인형을 그믐날에는 영화 벤허를, 온 가족이 둘러앉아 레저 디스크로 감상하였다. 영화가 끝나고 함께 카운트다운을 하며 듣던 제야의 종소리를 아이들은 지금도 얘기한다. 당시에는 귀하던 소니 40인치 HD TV에 Bose 901 등 스피커 여섯 개를 연결하여 서라운드로 듣던 추억을... 지금은 얼마나 좋아졌는가?
대형 UHD TV도 예전에 비하면 1/10 값이요, 영화나 동영상을 고화질로 자유롭게 다운받아 볼 수 있는 세상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추억 만들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 막히는 학원 스케줄에 가족이 밥 한번 같이 먹기 어려운 ‘교육환경’과 엄청나게 비싼 벌집에 틀어박혀 서로 담을 쌓고 사는 ‘아파트 문화’가 공모하여, 분노조절 장애인과 소시오패스를 양산하고, 이들이 오히려 지도자로서 군림하는 ‘오징어 게임’ 세상을 만들지 않았는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하고 올바른 선택이 모여 선순환의 일상(日常)을 만든다. 일상에는 만남이 충만하고 쉼표와 마침표의 리듬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상의 ‘회복이 아니라 재건’이다. 연말·연시와 같은 통과의례는, 만남과 리듬을 살려 성숙이라는 나이테를 그려주는 일상의 불씨요 방점(傍點)이다.
새해맞이 축제는 다가올 미지의 현실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담고 있어야 한다.
레이스의 출발신호처럼 계획과 결심을 북돋우는 응원과 격려의 팡파르(fanfare), 즉 가볍고 신나는 음악으로 축제의 막을 올려야 한다. 그래서 신년음악회에는 흥겨운 왈츠와 경쾌한 폴카가 어울린다. 비엔나 필이 80여 년 전 오스트리아의 자랑인 요한 슈트라우스로 신년 축하 연주를 시작한 이유다. 코비드 탓에 작년에는 무관객 연주였으나, 올해는 천 명을 제한 입장했다니, 선택받은 관객들은 희색만면이었다.
사이언스 빌리지 음악 감상 모임인 Happy LP에서는 이 연주회 동영상을 다운받아 1월 3일 시설 내 극장에서 함께 들었다. 8년 만에 바렌보임(Daniel Barenboim)이 지휘하고, 장소는 당연히 황금홀(Golden Hall, Musikverein, Vienna)이다. 잘 알려진 대로 요한슈트라우스 1세의 장남은 요한 2세요 차남은 요제프, 3남은 요절하였고 4남이 에두아르트인데, 1세는 자식들의 음악을 말렸건만 결국은 모두 음악 가족이 되었다.
금년 연주회의 특징은 첫째 ‘불사조의 행진’을 비롯, 요제프의 초연 여섯 곡을 주제로 택했다는 점이다. 에두아르트도 한 곡 들어 있다. 둘째, 치이러(Carl Michael Ziehrer)의 곡이 들어갔는데, 마치 영화 아마데우스의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처럼 당시 요한의 최대 라이벌이던 그의 곡이 연주된 것은 81년 만이란다. 셋째, 10분 남짓한 이 곡의 연주 도중에 단원들이 합창과 휘파람을 보태었다. 투박한 아마추어(?)들의 화음이 오히려 매력이어서,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세 곡의 앙코르(사냥터,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라데츠키) 직전 바렌보임은 팬데믹으로 황량한 세상에 화합과 공동체의식을 호소하는 멘트를 했는데, 시끄러운 이탈리아어 해설 탓에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아나운서가 1987년 타계한 바렌보임의 전처 뒤프레(Jacqueline du Pre: Cellist)도 언급했는데 얼핏 듣기에 가벼운 농담(젊은 시절 지휘자의 바람기?) 같았다. 휴게시간과 틈틈이 나비*를 따라 둘러보는 오스트리아의 풍광과 소품연주는, 작은 성(城)들을 소개한 작년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멋진 연출이었다. 그러기에 90여 나라에서 5천만 명 이상이 시청한다.
연말·연시의 통과의례는 구태여 따지면 제의·축제(Rite of Passage Vs. Initiation Ceremony)라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실은 야누스의 두 얼굴이다. 그러기에 1월은 야누스의 달(January) 아닌가? 지난 한 해의 회한과 반성, 그리고 동아리의 신입생처럼 새해를 맞는 설렘과 기대는, 한 바퀴를 이루는 나이테다. 단순한 달력 바꿔 걸기에 그치지 말고, 가족이 모여 추억 만들기와 다시 한 번 스스로 되돌아보기의 시간을 갖자.
-----------------------------------------------------------
* 혹시 이 나비는 Ziehrer의 곡(曲) 제목 ‘밤 각시나비(Nachtschwaermer)’ 아닐까? Jacqueline를 마음 아프게 한 그 여인과 Barenboim은 지금까지 해로하고 있다니, 단순한 바람기가 아니라 뒤늦게 만난 ‘짝꿍’이었나 보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