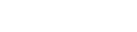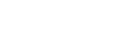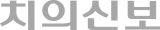어렸을 때 어른들 어깨 너머로 배웠던 바둑을 다시 시작했다. 누구나 취미 하나쯤은 있는 법인데, 목사에게 적당한 게 없어서 택한 게 바둑이다. 같이 둘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요즘 유행하는 사이버 바둑을 두는데 그럭저럭 재미있다. 실력은 그야말로 하수에 속하기 때문에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둑을 두면서 배우는 게 많다. 그 중에서 복기(復碁) 때문에 배운 게 있다. 바둑에는 다른 게임이나 스포츠와는 달리 복기라는 독특한 절차가 있다. 대국을 마친 후 두 대국자가 지금까지 싸워온 과정을 돌이켜 보면서 서로가 두었던 수들을 검토해 보는 것이다.
복기를 해보면 서로의 잘못된 착수가 밝혀지고 최선의 착점을 찾아 낼 수 있다. 또 대국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묘수가 발견되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둑 실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기를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같은 실질적인 이유 외에도, 나는 고수들이 복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양의 어떤 범속한 경지를 느낀다. 옛날부터 바둑을 ‘도(道)’라고 일컬어 온 이유가 이 때문일까. 승자와 패자가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아픔을 잠시 절제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지난 바둑을 돌이켜 보는 모습은 마치 구도자를 연상케 한다.
인생도 복기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처음부터 찬찬히 돌이켜 보면서 반추해 보는 것이다. 인생의 뒤안길을 곱씹어 보면서 잘못된 착수를 찾아내고 최선의 착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 보는 것이다.
그런데 복기란 게 참 묘한 데가 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하수들은 복기를 하지 않는다. 한다해도 대부분 복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나도 복기를 해 보려고 몇 번 시도는 해 봤다. 그러나 한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처음부터 똑같이 두어야 하는데 어디에다 두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수들은 참 신기하다. 그들의 복기는 거침이 없다.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서 중단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다. 차이가 뭘까. 왜 고수는 다 기억하고 하수는 기억하지 못할까. ‘목숨을 걸고 둔다’고 했던 조치훈 기사의 말에 해답이 있는 것 같다.
고수들은 한 수 한 수 집중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두었기 때문에 복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두지 않고 대충대충 두었기 때문이 아닐까.
인생의 고수는 누구인가. 복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는 매 순간 마다 집중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직감적으로 발견해 내는 사람이다. 하수는 누구인가. 자신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충대충 생각하고 살아 온 사람이다. 그래서 인생이 망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렇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복기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자기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미켈란젤로의 좌우명이었다. 그가 하루는 시스틴 채플이라는 교회당의 천정 벽화를 그리고 있었다. 그 천정은 까마득히 높았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는 사실 천정의 모습이 한 눈에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그 천정의 벽에 붙어서 선 하나 하나를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있었다.
이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친구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보게, 여기서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네. 그냥 적당히 해두고 내려오게나.”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소리쳤다. “여보게, 이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이 그림의 진가를 누가 알겠는가?”, “그야 자네와 하나님만이 알겠지.” “맞네,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나는 최선 이하로 일할 수는 없네.”
최선을 다하는 그의 자세가 불후의 작품을 탄생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