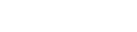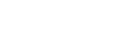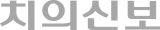'최예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인턴'의 전체기사
-

모든 것은 이롭다
한창 살을 에는 추위가 살벌하게 기승을 부리더니, 점차 해가 빨리 뜨고 늦게까지 머무는 것이 봄이 조금씩 찾아오고 있음을 체감하게 한다. 새로운 시작을 반기기 전, 이제 떠나야하는 내 첫 직장(?)을 정리하기 위해 강의실의 캐비닛을 조금씩 비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냥 작은 캐비닛일 뿐인데, 한참 살던 집에서 이사 가는 것 마냥 어찌나 추억이 담긴 물건이 많던지. 마음이 울컥해져 짐을 정리하는 데 한 세월이 걸렸다. 3년 동안 썼던 이 좁은 공간에는 캐비닛을 처음 배정받고 설레어하며 병원복을 입었던 원내생 때의 풋풋함부터, 시험 기간에 눈물 흘리며 필사적으로 외웠던 필기 흔적, 생일이라고 동기들이 빼곡히 적어준 편지들, 그리고 인턴 생활 내내 주머니에 꽂고 살았던 꼬질꼬질한 인계지들이 쏟아져 나왔다. 고작 지난 몇 년의 흔적인데 어쩜 그렇게 한 톨도 놓치기 아까울 정도로 소중한지, 그 치열했던 순간들이 사실은 얼마나 찬란한 시간이었는지 이제야 실감한다. 돌이켜보면 이 캐비닛 안에는 원망의 조각들도 섞여 있었다. 학생 시절, 끝도 없는 강의실 의자에 앉아 “대체 이걸 왜 배워야 하지? 임상에 나가면 정말 쓰긴 하는 걸까?”라며 오만하게 투덜거렸던 기억이 난다. 인
- 최예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인턴
- 2026-02-19 10:47
-

나는 문제없어
숨 가쁜 2주가 지나갔다. 레지던트 원서 접수, 인턴 시험, 직후 시행된 레지던트 선발 면접과 뒤이은 발표까지.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모든 과정이 한꺼번에 지나가 버린 느낌이었다. 오랜만에 다시 잔인한 평가의 자리에 서 있었다. 불과 1년 전 인턴 선발 과정에서도 면접을 치렀지만, 그때와 이번은 달랐다. 당시에는 국시 성적과 학부 성적이라는 정량적인 지표가 중심이었기에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다. 그러나 레지던트 선발 과정은 훨씬 복잡했다. 지난 10개월간의 인턴 생활에 대한 평가, 공개되지 않는 인턴 시험 점수(정확히는 지원 기관에만 공개되는), 그리고 면접까지 내가 알 수 없는 기준들 사이에 놓인 채 다시 ‘평가받는 사람’이 되었다. 10개월 동안 나름 성실하게 임했다고 자부한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준비한 인턴 시험도 후회 없이 마쳤다. 하지만 평가 기간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점점 작아졌다. 특히 내가 지원한 병원은 발표가 유독 늦어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마음을 졸였고, 퇴근시간이 지나도 잠잠한 핸드폰에 결국 ‘아, 떨어졌구나’ 하고 받아들였을 때 실망감은 생각보다 컸다.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 언제나 위로가 되는
- 최예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인턴
- 2025-12-17 16:30
-

갑과 을
갑을 관계는 어느 사회나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질서다. 연인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은연중에 그 관계가 자리잡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관계는 신기하면서도 오묘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을’이 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치과라는 환경에서도 치과의사는 자연스럽게 ‘갑’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환자는 그 결정을 따르게 된다. 그런 이유로 치과에서의 갑을 관계는 쉽게 자리잡을 수 있다. 그런데 아직 사회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내가 느끼기에, 그런 관계의 근본에는 때때로 자만이 숨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자만이라는 것은 정말 교묘하다. 우리가 ‘전문가’로서 권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자칫 그것을 당연시하게 여기고 우월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자만은 강한 상대가 등장하면 그때서야 그 본모습을 드러낸다. 더 강한 권력자가 나타나면 자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때서야 우리는 ‘을’처럼 변하기도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권위를 가진 환자 앞에서 ‘갑’의 자리를 내놓고 ‘을’처럼 행
- 최예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인턴
- 2025-08-06 16:52
-

실수 투성이 인턴
인턴으로 지낸지 벌써 3개월이 지나고 4번째 과를 만나기를 앞두고 있다. 국시를 마치고 인턴이 되기 직전 약간의 기대와 아주 큰 걱정을 안고 치의신보 원고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시간이 후루룩 흘러 인턴 생활이 익숙해졌다. 그 과정에서 인턴의 키워드는 실수라는 걸 실감하고 있는 중이다. 근무하는 과가 매달 바뀌고, 매달 새로운 교수님과 새로운 매뉴얼을 숙지해야 하다보니 실수가 잦을 수밖에 없다. 조금 익숙해질 법하면 다시 또다른 과의 매뉴얼을 달달 외워야하는 게 얄궂기도 하다. 특히 월초에 실수들이 쏟아지고 교수님, 선생님들께 혼나게 되지만, 점점 맷집이 늘어서인지 본능적으로 그 호통들을 머릿속에서 떨치는 법을 깨우쳐가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떠나지 못하고 내 맘속에 남아 종종 괴롭히는 실수들이 있는데, 바로 응급 당직에서의 잘못들이다. 응급 당직에서 실수를 하는 것은 교수님 어시스트를 하다가, 또는 환자 예진을 하다가 하게 되는 실수와는 다르다. 내가 책임을 지고 판단을 내려야하며 처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치과의사 면허는 땄지만 아직 진단을 충분히 해본 적이 없기에 진단과 처치에 확신을 갖기가 어려웠다. 첫 응급 당직을 섰을 때 외상환자가
- 최예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인턴
- 2025-05-28 16:40
-

새로운 이름표, 새로운 출발
인턴이 되었다. 바로 전 원고를 제출할 때까진 치의학대학원 본과생으로 소개되었던 신분이 이제는 아마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인턴으로 바뀌어 소개될 것이다. 본과 1, 2학년 땐 레지던트 선생님과 구별하지 못했던, 본과 3학년이 되고서는 점심 먹을 시간도 부족해 보였던 바로 그 ‘인턴선생님’이 된 것이다. 졸업식의 그 짜릿한 기쁨도 잠시, 2월의 마지막 주엔 인수인계를 받고 새 유니폼을 받으며 인턴으로 거듭날 준비를 했다. 본과를 졸업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된 인턴 생활이고, 근무복 바지와 자켓형 가운이 생겼다는 것 외에 원내생과 큰 차이가 없기에 “뭐 크게 다르겠어?” 라고 생각했었던 지난 시간이 무색하게, 막상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고 여러 행정업무를 하다보니 이게 첫 직장이 되었다는 것이 새삼 실감이 났다. 봉직의로서 사회에 나간 동료들보다는 순한 맛의 사회겠지만, 그래도 무엇이 중한가, 나 또한 이제 ‘사회인’이 된 것이다. 예상보다 길었던 등록금만을 내는 학생 신분을 드디어 벗어나, 월급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낯설고 신나는 변화였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의실에서 도란도란 떠들며 얘기를 나눴던 동기들이 이제는 서로 다른 일터에서 각자의 일을 해내고 있는
- 최예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인턴
- 2025-03-26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