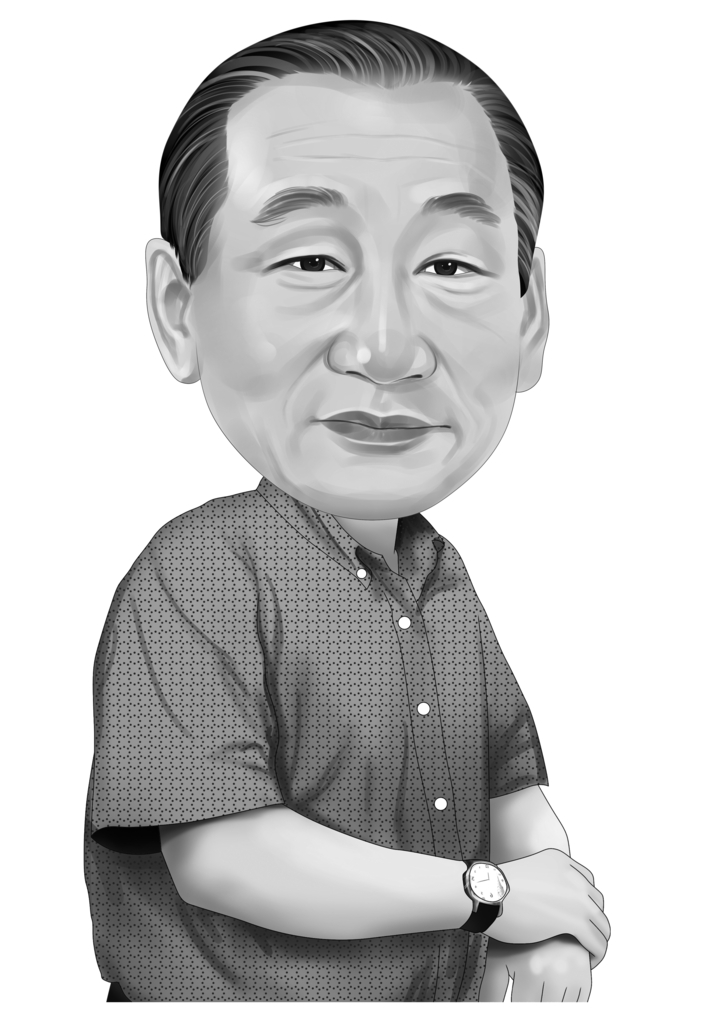 남과 북의 국력이 그만그만하던 1970년대 초, 육지에서 뚝 떨어진 서해와 남해의 수많은 낙도(落島)는 간첩선이 노리는 안보 취약지역이었다. 해군에서는 매년 정훈담당 중령을 단장으로 공연팀과 진료팀에 온갖 선물을 싸들고, 주민을 달래는(宣撫) 홍보선을 띄웠는데, 통상 중위를 보내는 유배(流配?) 자리에 필자가 찍혔다.
남과 북의 국력이 그만그만하던 1970년대 초, 육지에서 뚝 떨어진 서해와 남해의 수많은 낙도(落島)는 간첩선이 노리는 안보 취약지역이었다. 해군에서는 매년 정훈담당 중령을 단장으로 공연팀과 진료팀에 온갖 선물을 싸들고, 주민을 달래는(宣撫) 홍보선을 띄웠는데, 통상 중위를 보내는 유배(流配?) 자리에 필자가 찍혔다.
한 달 동안에 20여개 섬을 순회하는 강행군이었지만, 멀미를 모르는 체질 덕분에 크루즈여행처럼 즐겁고 멋진 추억으로 남았다. 그중에서도 해변이 온통 검은 몽돌로 뒤덮인 소안도의 하룻밤이 기억에 생생하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자리에서 일어나 해변에 나가 누웠다. 좌르륵 쓰르륵 파도에 밀고 쓸리는 자갈의 합창소리에 스르르 두 눈이 감긴다. 당시 대위 1호봉이 만원 남짓인데, 어느 일본회사가 자갈을 4억 원에 사가겠다고 제안했단다. 수만 년 파도에 갈고 닦인 자잔한 조약돌이 그토록 값진 자산이라니...
1995년 8월 치의신보에 실린 칼럼 ‘새로 적는 노트’를 일부 인용한다. “주택 2백만 호 건설은 6공 공약이었다. 건축자재가 동이 나자 저질 수입품을 마구 썼다. 소금기를 씻지 못한 바닷모래(海砂)에 자갈 대신 쇄석(碎石)이 들어갔다. 망치만 차면 목수요, 미숙련공까지 일당(日當)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소위 제1기 신도시 분당과 일산에 대규모 주택이 공급되어 결국 약속은 지켜졌고 부동산시장과 함께 노태우정권도 안정되었다. 그러나 ‘빨리 빨리’의 속도전은 그만큼 불안한 후유증을 남겼다. 쌍용양회의 시멘트와 포항제철의 철근은 넉넉했지만, 문제는 골재(骨材)였다. 주로 강과 개천에서 채취하는 모래와 자갈이 동이 나자, 채석장에서 캐낸 화강암을 부순 쇄석이 자갈을 대신하고, 바다에서 퍼 올린 모래가 소금기를 씻을 새도 없이 투입되었다.
물과 석고를 반죽하면 경화시간이 꽤 길다. 소금을 조금 집어넣으면 금세 굳는 대신, 단면이 거칠고 경도(硬度)가 급격히 떨어진다. 쇄석을 망치로 때리면 조약돌과는 달리 힘없이 부서진다. 게다가 건설현장에 숙련공 숫자마저 가뭄에 콩 나듯 드물었으니, 당시 뚝딱뚝딱 올라가는 신도시의 고층건물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조마조마했다. 분당 정자교의 보행로 붕괴사고 뉴스를 보면서 소환(召喚)된 기억이다. 성남시 탄천에 걸린 교량 중 16개의 보행로가 차도에 달랑 매달린 캔틸레버 공법이었다고 하니, 그동안 버틴 것만도 고맙다. 치과보철에서도 Cantilever Bridge는 없어진지 오래다. 이 보행로를 모두 재시공한다니 다행이요, 90년대 중반에 지은 다른 대형시설에도 정밀안전진단을 바란다.
제6공화국이 남긴 또 다른 선물. 당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건축법을 대폭 완화하자, 별 쓸모없던 주택가 지하실이, 대한민국 특유의 반(半) 지하 주거형태로 우후죽순 늘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없이 봉준호의 영화 ‘기생충’이 탄생하고,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이 되었을까? 대중문화는 서민의 삶에서 비롯하기에, 반지하·옥탑방이 호기심을 끌고, 스토리텔링·컨텐츠 등 새로운 소재에 목마른 서구의 시선이, K-문화를 향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표현은 바로 “K-문화란 무엇인가?”라는 자문(自問)에 대답을 못하는 이유다. 세종로에 최초의 정부종합청사 건축현장을 지켜보면서 엄청난 스피드에 신기해하던 일을 기억한다.
일단 기초공사를 단단히 다진 뒤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층씩 올라갔다. 일주일은 콘크리트 양생(養生)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자연 양생을 충분히 기다린 뒤, 철근 엮고 유압프레스로 거푸집을 밀어 올려 곧장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일정이 엄청나게 단축되면서도 건물은 건물대로 튼튼하다. 외국회사가 감리를 맡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체(要諦)는 ‘빨리 빨리’가 아니라, 한발 한발 ‘다지고 넘어가기’였다.
가장 빠른 걸음은 역시 ‘황소걸음’이요, 정품·정량을 써서 FM(敎本)대로 시공하기가, ‘신의 한 수’인가보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