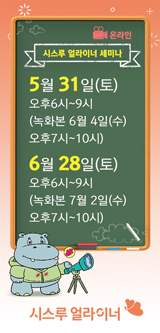햇살이 맑은 거리를 아이와 걷다보면 30여년 전 나도 이렇게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었던
때가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해본다.
어렸을 적 아버지는 내 세계의 전부였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처럼 보였다. 아버지는
대체로 말이 없었고 자주 웃지 않으셨으며, 그래서 그런지 무섭게 생각되어서 쉽게 다가가
말 걸기가 어려웠다. 대체로 우리 세대의 아버지들은 `근엄"하고 `위엄"이 있었으며 `권위"를
지키려는 듯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병원 영안실에 걸린 고인들의 영정을 보면 하나같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으며 입은 굳게
다물고 있다. 그들에게도 모두 철부지 유년시절이 있었고, 개구쟁이 소년시절이 있었으며,
혈기와 낭만이 넘치는 청년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도 때로는 유쾌하게 웃고 농담을 하고
뜨거운 사랑을 고백했던 시절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들의 표정은 저토록 견고해졌을까? 생존경쟁의 전장에서 취직을 하고,
집을 장만하고, 아이들을 기르고, 세상고락에 시달리면서 변해 버렸을까? 때로는 부당한
대우와 시끄러운 분쟁에 시달리면서 분노하고 고뇌하다가 유연한 웃음을 잃은 것일까?
우리 민족은 비교적 잘 웃지 않는 민족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한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걸친
민족들의 안면근은 경직되어 있는 편이고 그 특유의 `무표정한 인상"이 아메리칸 인디언의
표정인데 우리의 모습도 그에 흡사하다고 한다. 그래서 웃을 듯 말 듯 어색하게 입 꼬리를
올린 듯한 표정을 "한국인의 표정"이라고 하나보다.
그런데 얼마 전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송자 교수의 수필집을 읽다가 `아버지"에 대한
특별한 느낌을 받았다.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 들은 가장 아팠던 꾸중은 “너 이러면
되니?”하는 말이었다고 한다. 송 교수는 아버지의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혀 괴로웠다고
술회하였다. 아버지가 잔잔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너 이러면 되니?"라고 하신 말씀이 강한
화살처럼 그의 마음에 파고들었던 것은 왜일까? 물론 꾸중을 받아들이는 당사자의 자세와
성격이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그러나 그 부드러운 말이 강한 메시지로 전달되었던 이유는
평소 아버지께서 자식을 향해 보여주셨던 자상하고 따뜻한 모습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른 위인전을 읽어보더라도 세계적 석학이나 위인의 아버지들은 대부분 자상하고
부드러우며, 오히려 그들의 어머니가 더 엄격하고 단호하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자식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지극한 엄마의 정성에 좌우되는, 무뚝뚝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우리 세대는 과연 자식들에게 어떤 아버지의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을까? 여전히 권위적이며
사랑의 표현에 인색하여 안으로만 정을 감추고 살지는 않는지.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아버지이며, 사회에서는 또 어떤 지도자의 모습일까? 진정으로 학문을
하지 못하는 교수, 돈벌이에만 치중해 있는 사장일수록 제자나 직원들에게 더 권위적이고
무서운 모습으로 군림하는 것을 가끔 본다. 그처럼 자식에게 적극적인 관심이 적고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누림에만 급급한 아버지일수록 더 웃음이 적어지고 권위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진실로 능력 있고 강한 자는 부드러운 위엄을 지닌다. 그는 많은 것을
알기에 힘있는 척하지 않아도 인정을 받으며, 그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어
전달되는 것이다.
오늘 저녁에는 모처럼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근처의 공원이라도 산책해야겠다. 네 짝은 예쁘냐,
줄넘기를 쉬지 않고 몇 번이나 넘을 수 있니. 할 말이 없으면 쓸데없는 농담이라도 걸어서
장난을 청하고 싶다.
아무리 저들을 사랑한다 주장해도 표현에 인색하여 안으로 감추는 것은 무의미할 뿐이니까.
아름다운 사랑과 정은 감추고, 권위만 휘둘러 호령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려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일 테니까.
그러나 나도 어느새 내 아이에게 권위와 침묵에 길든 아버지로 자리를 굳히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다. 그리하여 내 아버지가 그랬듯이 춥고 쓸쓸한 지역으로 밀려나고 있는 지도 모를
일이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