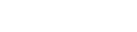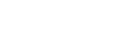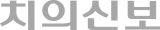이번 월드컵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을 추억으로 새겨지고 있다. 오직 축구 한 가지만으로도 이렇게 신나는 잔치를 즐길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이 하나되어 열광하고 환호하는 것이 이토록 아름답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온 지구촌을 하나로 어울리게 한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 수백만의 붉은 인파, 마치 온 나라의 붉은 페인트를 다 쏟아 부어놓은 것 같은 모습은 오래오래 남을 잔상(殘像)이 될 것이다.
또 하나 기억될 게 있다. 국가대표들을 맡아 월드컵 역사에 최고의 기적을 만들어 낸 히딩크 감독의 모습이다. 그가 우리에게 준 기쁨, 특히 그의 리더십은 비단 축구계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깊이 아로새겨질 것이다.
특히 포퓰리즘(populism)에 좌우되지 않는 그의 모습은 내게 인상깊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에 맹목적이어서 일까? 토양자체가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의 리더십 문화는 대중적인 평가나 비판 앞에 너무 취약하다. ‘민심 속에 나타난 천심’ 때문에, 사실 나는 이 말에 회의를 품을 때가 많지만, 우리의 리더들은 자신의 비전과 전략을 너무 쉽게 내던지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그러나 히딩크는 비전에 맞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냉철한 전략을 세운 뒤, 대중의 비판이나 인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신을 꾸준히 밀고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지휘봉을 맡고 얼마동안의 부진을 계속할 때, 대중은 물론이고 전문가들이나 다수의 언론조차도 값싼 승리를 내 놓으라고 야단들이었다. 그러나 그는 논쟁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길을 갔다. 그리고 위대한 승리로 자신의 길이 옳았음을 웅변하고 있다. 멋있다.
불과 2주 사이에 대통령을 다섯 번이나 갈아치웠던 나라, 국가적 부도사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여러 진단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페론주의(peronism)의 포퓰리즘이 실패의 주범이라고 보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다. 1946년 대통령이 된 페론이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사생아 출신의 부인 에비타의 영향으로 노동자들의 욕구만을 만족시켜주려 했던 게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것이다.
이 시각에 의하면, 산업구조개편과 같은 길고 지루한 싸움을 포기하는 대신, 그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임금인상을 약속하며 대중의 장미 빛 꿈과 영합한 셈이다.
특권을 누리는 것은 좋아하지만 희생하고 땀을 흘리는 것을 꺼려하는 대중과 영합한 그의 정책은 결국 아르헨티나를 아수라장으로 몰아 넣었다. 에비타는 “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해 울지 말아요” 노래했지만, 이제 그녀의 조국은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뿌려놓은 씨 때문에 울고 있다.
때때로 민심과 천심은 일치하지 않는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다. 이스라엘이 종으로 살던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의 고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모세는 천심(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 그러나 민심이 원하는 것은 천심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이었다. 모세의 형 아론은 이 무지한 대중과 영합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다. 엄청난 재앙을 불러들인 것은 물론이다.
리더십은 대중의 욕구를 채워주어야 한다. 그러나 참된 리더십은 그 대중의 욕구로부터 자신의 비전과 전략을 지켜야 한다. 대중은 때때로 무지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배고픈 오 천명의 군중에게 빵을 주셨지만, 그를 왕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거부하셨다. 그리고 자신의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전략인 십자가의 길을 말없이 걸어가셨다.
진정한 리더십은 쇼맨십이 아니라 ‘서벤트십’(servantship)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