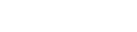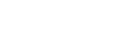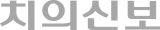현대사상의 파노라마 <6>
<레비-스트로스 구조주의 인류학>
비판적 음미
레비-스트로스의 인류학은 친족체계를 비롯한 미개 사회의 문화가 완벽하게 기호학적으로 코드화되어 있음을 말한다.
이런 생각은 그런 구조가 영원한 전체이자 하나의 순환 체계라는 것, 친족체계를 이루는 요소들이 가역적(可逆的) 관계에 놓인다는 것, 근친혼의 금지는 친족체계의 대칭과 평형을 위한 것이라는 것, 혼인이란 심리적-정치적-경제적 문제이기 이전에 논리적-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말한다.
이런 생각의 한계는 현대 사회에서가 아니라 미개 사회 자체 내에서 발견된다. 마샬 살린스는 피지 섬의 한 신화를 제공한 바 있다.
“‘최초의 인간"은 다만 한 사람이었으며, 늙은 처와 세 딸을 거느리고 비타레비의 서쪽 해안 근처에 살고 있었다. 주변에는 딸들의 결혼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노인은 처를 죽이고 대신 딸을 처로 맞이하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딸들은 파도에 밀려온 젊고 잘 생긴 이방인을 발견하고, 그를 간호한 후 그와의 결혼을 진행시켰다. 젊은이는 노인에게 식량이 되는 식물의 재배를 답례로 약속하면서 결혼을 신청했다.
노인은 화가 나서 거절하면서, 딸이 탐나면 구체적으로 예의를 갖추도록 요구했다. 젊은이는 자신과 더불어 파도에 밀려온 고래를 생각해내고, 이 땅의 사람들이 고래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고래의 앞이빨 네 개를 뽑아 그것들을 답례품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고래 이빨"을 뜻하는 ‘타바"라는 이름의 이 젊은이는 신화 가운데의 신화라고 할 수 있을 한 이야기를 꾸며냈다. 숲을 간척해 이 이빨들을 심으면 8일 내에 식량들이 수없이 증산된다는 아야기였다.
이 말에 넘어가 노인은 떨떠름하게 딸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노인은 그 대가로 몇 개의 법을 만들어냈다.
첫째, 이후 고래 이빨은 그 영웅(젊은이)의 이름을 따 ‘타바"라고 부른다. 둘째, 결혼에의 답례로 이 고래 이빨을 주어야 한다. 셋째, 이후 파도에 밀려오는 자들이 있으면 죽여서 먹는다
."
우리는 이 신화에서 ‘바깥"의 문제를 발견한다. 레비-스트로스에게 모든 결혼은 평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평형을 이루는 체계 내의 문제이며, 바깥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신화 -- 중요한 것은 이런 유의 신화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점이다 -- 에서 젊은이는 외부에서 오며, 따라서 교환은 성립하지 않는다.
또 하나 여기에서 권력의 문제를 짚어볼 수 있다. 구조주의적 사유에서 권력이란 곧 자리의 분포를 말한다. 그러나 피지의 신화는 “권력이란 바깥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건국 신화에서 권력이란 원칙상 ‘단 한번" 발생한다. 따라서 불가역적이다.
레비-스트로스는 주체의 바깥을 보았지만, 그 바깥의 바깥을 보지는 못했다.
젊은이와 딸의 결혼은 결코 평화로운 교환과 평형의 관계가 아니라 권력의 관계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혼은 자연의 문제 -- 자연과 문화의 경계선의 문제 -- 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정치적 문제인 것이다. 레비-스트로스는 비대칭적인 결혼을 ‘실패한 결혼"으로 봄으로써 자신의 이론 구조에 지나치게 집착했다.
레비-스트로스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는 ‘구조의 바깥"을 생각하게 된다. 구조의 바깥, 코드의 바깥에는 무엇이 있을까? 거기에는 카오스와 욕망이 있다. 구조란 궁극적인 것이 아니다.
궁극적인 것은 카오스와 욕망이다. 구조/코스모스는 이 욕망/카오스를 길들인 것이다. 그러나 욕망과 카오스는 결코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으며 안정된 듯한 구조/코스모스 아래에는 늘 욕망과 카오스가 물결치고 있다.
1968년에 발생한 대대적인 혁명은 구조주의적 세계관에 큰 타격을 가했다. 이제 레비-스트로스가 이야기한 구조주의는, 마치 자연과학에서 표면적인 안정성과 법칙성 아래에서 분자들의 요동이 발견되었듯이, 그리고 ‘혼돈으로부터의 질서"가 이야기되듯이, 세계의 어느 한 층위, 한 테두리 내에서의 이해로 전락했다.
그러나 구조주의적 ‘사유 양식" -- 주체보다 구조를, 실체보다 관계를, 내용보다 구조를 파악하는 방식 -- 은 이후의 사상들에도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친다.
철학아카데미 02)722-2871
www.acaphil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