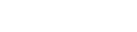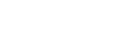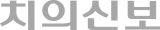중국 양나라 무제가 달마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물었다. 양무제는 수많은 절과 탑을 세우고, 재를 베풀고, 2만에 달하는 스님들을 뒷바라지하여 불심천자(佛心天子)라고 일컬어지던 왕이었다.
“제가 한 불사(佛事)의 공덕(功德)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심 큰 기대를 갖고 물었는데, 달마대사의 대답은 너무 뜻밖이었다.
“실로 공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그것은 상대적인 인과(因果)일 뿐, 물체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아서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훗날 육조 혜능대사 역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양무제가 아무리 절을 많이 짓고 재를 베풀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어도 그것은 복을 구한 것이니 공덕으로 삼을 수 없다고. 공(功)이란 안으로 나를 낮추는 것이요, 덕(德)이란 밖으로 예(禮)를 행함이니, 공덕을 닦는 사람이라면 상대를 둘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행위에는 유위(有爲)의 행과 무위(無爲)의 행이 있다. 유위의 행이란 인연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함이요, 무위의 행이란 인과를 초월한 행위를 말한다. 진정한 보시라면 반드시 이 무위의 행이어야 하는데, 이를 상(相)에 머물지 않는 보시,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라고 한다. 즉, 베푼다는 생각도 없고 받는다는 생각도 없이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자리에서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양무제의 행은 ‘내가 했다’는 상(相)에 집착한 유위의 행이었기 때문에 참된 공덕이 되지 못한 것이다.
무주상보시에 대해 큰스님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이 있다.
“부처님의 나눔에는 풀 한 포기, 곤충 한 마리, 산 세상 죽은 세상 가림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세계에서는 비록 겉모습이 다르다 해도 둘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그 둘 아닌 도리를 깨닫는 작업이니, 둘이 아닌 줄 알면 누구에게 무엇을 해 주었다고 하겠습니까. 자신이 자신에게 한 일인데. 그와 같이 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보시가 되는 것이니 ‘내가 했다’는 마음 없이 베풀라는 것입니다.”
보시에는 물질을 베푸는 재보시((財布施)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법보시(法布施), 정신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감싸주는 무외보시(無畏布施)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중 재보시만이 보시이고, 이것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보시는 반드시 법보시를 함께 베풀어야 한다. 즉, 마음과 함께 베풀어야 하는데, 그래야만 진정한 공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보시는 세세생생을 건지는 것이고 무명을 벗겨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물질만 베푼다면 그것은 50%의 유위법에 머물 뿐이다.
만약 양무제가 법보시를 함께 했다면 달마대사가 어떻게 대답했을까.
50%의 무위법을 마저 채웠으니 공덕이 많다고 했을까. 아니면 둘이 아닌 도리이니 역시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했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두어야 할 것은, 달마대사가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한 것은 공덕이 정말 없어서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너무 많아서 없다고 한 것이다. 또한 그것은 모든 공덕을 공(公)의 자리, 즉 전체의 자리로 돌려놓는 자비행이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