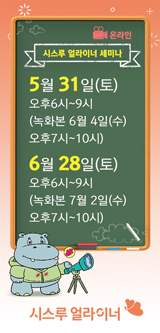봄을 만나러 가는 길
처음 만나는 사람이 반가워 부끄럼도 모르고 권하는 대로 주저앉아 밥 두 그릇을 비워내고, 과일과 차까지 얻어 마신후, 5월 첫 주말,철쭉이 피면 제암산에서 다시 만날것을 약속하고.... 느리게 느리게 모퉁이를 돌아오고 있는 봄.그 지루한 기다림을 견디다 못해, 봄을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올 때 되면 오겠지. 네가 뭔데 안 오고 배겨?”의 냉소를 넘어, “네가 오지 않는다면 내가 만나러 가겠다.”는 적극적 삶의 자세를 들이밀고, 금요일 새벽 4시, 서울을 떠났습니다.밤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비라도 내릴 듯 하늘은 흐리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새벽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언제나처럼 가슴을 애잔하게 합니다.음악소리마저 꺼지고, 우동이며 국수를 담느라 쉼 없이 움직이던 손놀림도 멎고, 바쁘게 오가던 사람들의 발길마저 끊겨, 고장난 TV처럼 저 혼자 지직거리며 깨어있는 새벽의 휴게소...마치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 속에 들어온 듯, 지독하게 슬쓸하고 지루한 일상의 풍경입니다. 커피 한 잔을 나누어 마신 우린, 타닥타닥 유리창을 때리며 내리는 빗소리를 음악 삼아 남으로 남으로 달렸지요. 곡성으로 들어서니 섬진강이 보입니다. 이제는 밥짓는 연기 하나 피어오르지 않는 강변의 아침이지만, 여전히 강은 언제나 그랬듯 산 사이 작은 마을들을 품고 거기 있었지요. 아주 오래 전부터 처연히 흐르고 있었을 저 강. 괜시리 마음이 아득해져 차를 세우고 강변에 앉아봅니다. 누군가는 오지 않는 이를 기다리며 강변을 서성거리기도 했을 것이며, 사랑에 실패한 젊은 벗들이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묻고 울기도 했을 테고, 세상살이에 지쳐 헤지고 덧난 상처 투성이로 돌아와 말없이 저무는 강변을 바라보며 서 있던 이웃도 있었겠지요. 얼마나 많은 착한 영혼들이 이 강물에 마음을 풀어 놓고 위안 받으며, 거친 세월을 견뎌왔을까요? 봄이 와 꽃이 피고, 풀씨가 흩날리고, 서리가 내리고, 찬 바람 부는 겨울 지나, 다시 봄이 오는 것을 보며, 지친 등을 피며 다시 일어섰을 이들을 생각해 봅니다. 나의 삶도 꺾이고 쓰러질지언정 끊임없이 다시 일어서는 그것이기를, 봄이 오는 섬진강변에 서서 기원해 봅니다. 아침 9시. 구례군 산동면에 들어서니, 3월이면 온 마을을 노랗게 뒤덮는다는 산수유는 아직 일러 피지 않았네요. 낮은 돌담 너머를 기웃거리며 남의 살림살이들을 훔쳐보다 돌아섰지요. 승주 선암사 입구에 저를 내려준 선배는 미안한 얼굴로 돌아가고, 저는 선암사로 들어섰습니다. 이른 아침의 절은 고요했습니다. 중창을 하느라 어수선한 절 뒤안. 거기, 소리도 없이 매화가 피었더군요. “너도 견디고 있는 거니? 너도 기다림에 지쳐 이렇게 먼저 터져버린 거니?” 한 시간 남짓 선암사에 머물며 아직은 단단히 몸을 웅크린 동백이며, 대웅전 기와 지붕을 배경으로 수줍게 선 어린 매화나무들을 오래 오래 바라보았지요. 비에 젖은 여린 꽃잎들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조계산을 넘었습니다. 산길도 비에 젖어 오가는 이 하나 없이 고즈넉했습니다 1시간 반을 걸어 정상인 장군봉에 오르니, 아저씨 두 분이 점심을 드시고 계십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 반가워 부끄러움도 모르고 권하는 대로 주저앉아 밥 두 그릇을 비워내고, 과일과 차까지 얻어 마신 후, 첫 주말, 철쭉이 피면 제암산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안개에 덮힌 산을 넘었지요. 3시간 남짓, 온 산을 혼자 차지하다가 내려오니 송광사입니다. 선암사도 그랬듯이 이 절 역시 들고 나는 길이 아직 흙길로 고스란히 남아 있어 반갑기만 합니다. 송광사 앞 찻집에 들어가 모과차 한 잔을 시켜 놓고, 배낭 속에 넣어온 김용택을 잠시 읽기도 하고, 가까운 이에게 짧은 엽서 한 장을 쓰기도 하다가, 다시 순천으로 오는 버스를 탔습니다. 불안한 듯 전화를 걸어온 선배에겐 금산에 오를 거라고 일러 놓고, 터미널에서 막 떠나려는 남해행 막차를 붙잡아 탔지요. 남해읍에 내리니 금산까지 가는 버스는 이미 끊긴 후라, 택시를 타고 산중턱까지 올랐습니다. 마중 나온 산장 주인 아들의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20여분 산을 오르니 금산산장입니다. 산장은 정상 조금 못 미친 곳에 자리잡아 화장실 가는 길에도, 세면장 앞에서도, 바다와 섬들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방안의 작은 창을 열어도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미리 불을 지펴놓은 작은 방엔 이불이 깔려 있을 뿐, 아무 것도 없는 단순함입니다. 이성복의 ‘남해금산’을 들었다가, 오지 않는 잠에 이리저리 뒤척이다, 문득 눈을 뜨니 5시 40분. 사위는 이미 밝아오고 있습니다. 일월봉에 올라 해가 솟기를 기다렸습니다. 바람도 없는 바다는 잔잔하게 가라앉아 있고, 아직 잠 깨지 않은 섬 마을들이 불빛을 깜박거리며 숨을 쉬고 있습니다. <
처음 만나는 사람이 반가워 부끄럼도 모르고 권하는 대로 주저앉아 밥 두 그릇을 비워내고, 과일과 차까지 얻어 마신후, 5월 첫 주말,철쭉이 피면 제암산에서 다시 만날것을 약속하고.... 느리게 느리게 모퉁이를 돌아오고 있는 봄.그 지루한 기다림을 견디다 못해, 봄을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올 때 되면 오겠지. 네가 뭔데 안 오고 배겨?”의 냉소를 넘어, “네가 오지 않는다면 내가 만나러 가겠다.”는 적극적 삶의 자세를 들이밀고, 금요일 새벽 4시, 서울을 떠났습니다.밤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비라도 내릴 듯 하늘은 흐리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새벽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언제나처럼 가슴을 애잔하게 합니다.음악소리마저 꺼지고, 우동이며 국수를 담느라 쉼 없이 움직이던 손놀림도 멎고, 바쁘게 오가던 사람들의 발길마저 끊겨, 고장난 TV처럼 저 혼자 지직거리며 깨어있는 새벽의 휴게소...마치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 속에 들어온 듯, 지독하게 슬쓸하고 지루한 일상의 풍경입니다. 커피 한 잔을 나누어 마신 우린, 타닥타닥 유리창을 때리며 내리는 빗소리를 음악 삼아 남으로 남으로 달렸지요. 곡성으로 들어서니 섬진강이 보입니다. 이제는 밥짓는 연기 하나 피어오르지 않는 강변의 아침이지만, 여전히 강은 언제나 그랬듯 산 사이 작은 마을들을 품고 거기 있었지요. 아주 오래 전부터 처연히 흐르고 있었을 저 강. 괜시리 마음이 아득해져 차를 세우고 강변에 앉아봅니다. 누군가는 오지 않는 이를 기다리며 강변을 서성거리기도 했을 것이며, 사랑에 실패한 젊은 벗들이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묻고 울기도 했을 테고, 세상살이에 지쳐 헤지고 덧난 상처 투성이로 돌아와 말없이 저무는 강변을 바라보며 서 있던 이웃도 있었겠지요. 얼마나 많은 착한 영혼들이 이 강물에 마음을 풀어 놓고 위안 받으며, 거친 세월을 견뎌왔을까요? 봄이 와 꽃이 피고, 풀씨가 흩날리고, 서리가 내리고, 찬 바람 부는 겨울 지나, 다시 봄이 오는 것을 보며, 지친 등을 피며 다시 일어섰을 이들을 생각해 봅니다. 나의 삶도 꺾이고 쓰러질지언정 끊임없이 다시 일어서는 그것이기를, 봄이 오는 섬진강변에 서서 기원해 봅니다. 아침 9시. 구례군 산동면에 들어서니, 3월이면 온 마을을 노랗게 뒤덮는다는 산수유는 아직 일러 피지 않았네요. 낮은 돌담 너머를 기웃거리며 남의 살림살이들을 훔쳐보다 돌아섰지요. 승주 선암사 입구에 저를 내려준 선배는 미안한 얼굴로 돌아가고, 저는 선암사로 들어섰습니다. 이른 아침의 절은 고요했습니다. 중창을 하느라 어수선한 절 뒤안. 거기, 소리도 없이 매화가 피었더군요. “너도 견디고 있는 거니? 너도 기다림에 지쳐 이렇게 먼저 터져버린 거니?” 한 시간 남짓 선암사에 머물며 아직은 단단히 몸을 웅크린 동백이며, 대웅전 기와 지붕을 배경으로 수줍게 선 어린 매화나무들을 오래 오래 바라보았지요. 비에 젖은 여린 꽃잎들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조계산을 넘었습니다. 산길도 비에 젖어 오가는 이 하나 없이 고즈넉했습니다 1시간 반을 걸어 정상인 장군봉에 오르니, 아저씨 두 분이 점심을 드시고 계십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 반가워 부끄러움도 모르고 권하는 대로 주저앉아 밥 두 그릇을 비워내고, 과일과 차까지 얻어 마신 후, 첫 주말, 철쭉이 피면 제암산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안개에 덮힌 산을 넘었지요. 3시간 남짓, 온 산을 혼자 차지하다가 내려오니 송광사입니다. 선암사도 그랬듯이 이 절 역시 들고 나는 길이 아직 흙길로 고스란히 남아 있어 반갑기만 합니다. 송광사 앞 찻집에 들어가 모과차 한 잔을 시켜 놓고, 배낭 속에 넣어온 김용택을 잠시 읽기도 하고, 가까운 이에게 짧은 엽서 한 장을 쓰기도 하다가, 다시 순천으로 오는 버스를 탔습니다. 불안한 듯 전화를 걸어온 선배에겐 금산에 오를 거라고 일러 놓고, 터미널에서 막 떠나려는 남해행 막차를 붙잡아 탔지요. 남해읍에 내리니 금산까지 가는 버스는 이미 끊긴 후라, 택시를 타고 산중턱까지 올랐습니다. 마중 나온 산장 주인 아들의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20여분 산을 오르니 금산산장입니다. 산장은 정상 조금 못 미친 곳에 자리잡아 화장실 가는 길에도, 세면장 앞에서도, 바다와 섬들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방안의 작은 창을 열어도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미리 불을 지펴놓은 작은 방엔 이불이 깔려 있을 뿐, 아무 것도 없는 단순함입니다. 이성복의 ‘남해금산’을 들었다가, 오지 않는 잠에 이리저리 뒤척이다, 문득 눈을 뜨니 5시 40분. 사위는 이미 밝아오고 있습니다. 일월봉에 올라 해가 솟기를 기다렸습니다. 바람도 없는 바다는 잔잔하게 가라앉아 있고, 아직 잠 깨지 않은 섬 마을들이 불빛을 깜박거리며 숨을 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