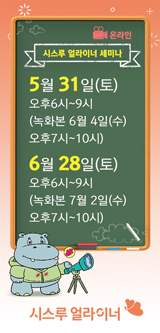봄을 찾아 떠나는 남도여행
우리에게 던져진 21세기의 진정한 화두는 ‘나눔’임을 새삼스레 생각해 보게 한,
진정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 수도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한, 행복한 만남이었습니다.
내려다보이는 보리암엔 또 어떤 간절한 소원을 빌러 온 이들이 해돋이를 기다리며 바다를 향해 몸을 돌리고 선 모습이 보입니다.
한참을 앉았더니, 수평선 너머로 해가 솟아오릅니다.
구름 낀 남해바다를 뚫고 솟아오른 붉은 해는 분명 어제의 해와 다를 게 없는 데도 왜 이렇게 가슴을 설레게 하는 걸까요?
또 다시 비척대며 끝까지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걸 알면서도, 기어이 다시금 삶에의 의지를 솟게 하고야 마는 아침해.
해돋이를 보고 돌아와 먹는 아침밥은 꿀맛입니다. 산장지기 총각에게 가까운 날에 다시 오겠다는 허튼 약속을 하고 산장을 나서, 이리저리 산을 둘러보고 내려옵니다. 산을 다 내려오니 매표소의 아저씨가 커피 한 잔을 하고 가라며 붙잡는 바람에 사무실에 들어가 또 한참을 놀다가 나섭니다.
상주 해수욕장 앞에서 광양으로 가기 위해 히치하이킹을 시도했습니다. 운이 좋아 마침 첫차가 광양으로 가는 트럭입니다. 남해에서 광양 가는 길, 그 길은 푸른 남해바다를 끼고 달리는 눈물나게 아름다운 길입니다.
어린 보리 싹들과 이미 성큼 커버린 마늘이 파랗게 자라고 있는 들녘엔 허리 굽혀 일을 하는 부지런한 농부들이 보이고, 참으로 오랜만에 소달구지를 끌고, 나무지게를 지고 도로변을 느릿느릿 걷는 촌로를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날은 맑게 개어 있고, 햇살과 바람이 하도 따스해 봄이 성큼 온 듯합니다.
여수에서 양어장을 한다는 아저씨는 “순천에서는 인물자랑하지 말고, 벌교에서는 주먹자랑하지 말고, 여수에서는 돈자랑하지 말라.”는 게 맞는 얘기냐는 제 물음에 대충은 맞는 것 같다며 웃으십니다. 순천 여자들이 예쁘긴 예쁘더라, 한다하는 주먹패들을 보면 벌교 출신인 경우가 많더라, 예전에 여수는 바다를 끼고 있어 육지보다는 먹을 게 풍부하고, 돈도 더 많이 돌았지만, 그건 옛날 얘기같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하시구요.
커피 한 잔 하고 가시겠냐는 아저씨의 꼬드김(?)을 아쉽게 물리치고, 트렉팀을 만나기 위해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사투리가 전혀 없는 기사아저씨의 서울 말씨가 수상해(?) 어디서 오셨냐고 여쭤보았더니, 서울에서 다니던 회사가 부도난 후, 사업마저 실패해 부인과 함께 이 곳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의상디자인을 전공한 부인은 광양터미널에서 조그맣게 옷장사를 하고, 아저씨는 택시를 모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 있는 딸은 다 커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아저씨 내외는 큰 돈 못 벌어도 먹고 살만큼 벌이가 되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며 사는 재미에, 서울에서 잘 나가던 시절은 하나도 그립지 않다며, 새 삶을 얻은 것 같답니다.
요즘 시간 날 때마다 찾아가 함께 지내는 소녀가장 4명이 있는데, 내년 쯤엔 그 아이들 전부를 호적에 올리려고 한다며 수줍게 웃으시는 아저씨.
조용조용 말씀을 건네던 아저씨가 갑자기 창 밖을 가리키길래 내다보았더니, ‘사랑의 집짓기 운동 본부’에서 지은 공동주택이 섬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봄 햇살을 받고 어여쁘게 서 있더군요. 우리에게 던져진 21세기의 진정한 화두는 ‘나눔’임을 새삼스레 생각해 보게 한, 진정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 수도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한, 행복한 만남이었습니다.
매화마을에서 트렉팀을 만나 함께 고소성엘 올랐습니다. 악양들판과 하동을 끼고 도는 섬진강 푸른 물살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산성에서 나른한 오후의 햇살을 즐기다 서울로 출발했지요.
어쩌다 고속도로변에 버려진 옥희와 전, 순진해 보이는 총각의 차를 골라 타고 서울로 돌아와야 했지만, 그것마저 즐거운 추억으로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월의 지리산 종주 이후 두 번째로 떠난 혼자만의 여행. 가까이 온 봄을 마음껏 만났을 뿐더러, 오랫동안 애써 외면했던 스스로를 깊게 들여다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지요.
살아있음이 다시금 감사하고 행복했던, 짧은 길떠남이었습니다. 미당이 “나를 키워준 건 8할이 바람”이었다고 고백했다면, 저를 키워 준 것의 8할은 길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은 생 전체를 낯선 길 위에서 소요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 길 위에서 진정 자유롭고, 넓고 깊어지는 스스로를 만날 수 있는 한, 길떠남을 두려워하진 않으렵니다.
에밀리 브론테의 말을 다시 중얼거려 봅니다. “그래. 나의 삶은 그 마지막까지 빠르게 지나가고 있지. 삶과 죽음을 견디기 위한 자유로운 영혼과 용기. 그 모든 것은 내가 원하던 것.”
다시 본 트렉의 낯익은 얼굴들. 다들 여전한 것 같아 보여, 그 한결같음이 반가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