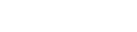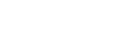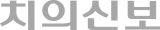-

전자담배, 면역력 떨어뜨린다
전자담배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슈퍼바이러스의 독성을 강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학 연구팀이 ‘분자의학 저널(Journal of Molecular Medicine)’ 최신호에 전자담배가 미치는 악영향을 연구해 이 같은 결과를 실었다고 메디컬뉴스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연구팀은 쥐 실험을 통해 하루 1시간씩 주 5일, 4주에 걸쳐 쥐들을 전자담배 연기에 노출시킨 결과, 전자담배 연기를 흡입한 쥐들은 그렇지 않은 쥐들에 비해 기도와 혈액의 염증표지 수치가 10% 높게 나타났다. 또 폐렴에 감염된 쥐들이 전자담배 연기에 노출된 경우에는 박테리아의 독성이 훨씬 강해진다는 사실도 밝혀졌다.특히, 슈퍼박테리아인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된 보통 쥐들은 모두 살았는데 전자담배 연기에 노출된 뒤 MRSA에 감염된 쥐들은 25%가 죽었다.최근 연구에서는 MRSA가 담배연기에 노출되면 독성이 강해져 면역세포의 공격에 잘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 전수환 기자
- 2016-02-16 15:09
-

로봇이 치과 공포감 해결사
“안녕하세요? 저는 메디입니다. 저희 ○○○치과의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 환자님의 금일 치료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곧 로봇이 치과의 풍경을 바꾸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미국 메디컬과 치과 일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용 로봇이 환자의 불안감, 특히 아이들의 치과 공포증 감소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어 화제다. 이 로봇의 이름은 ‘메디’. Rx Robot사에서 개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이 로봇을 치과 현장이나 병원에서 장기간 시험 운영한 결과, 아이들의 공포감이 절반 가까이 대폭 줄었다는 게 미국 뉴저지 올린덴탈그룹 관계자들의 말이다. 리처드 올린 올린덴탈그룹 대표는 “메디는 환자들을 미소짓게 만든다는 점에서 치과에 획기적인 요인(Wow factor)를 가져온다”며 “31년 동안 치과 임상 경력을 통틀어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든 것은 메디가 거의 처음이다. 매우 재밌는 녀석”이라고 소개했다. 올린덴탈을 찾는 환자들은 메디와 처음 인사를 나눈다. 메디는 자신을 소개한 후 치과의 일반적인 프로세스, 엑스레이, 충전치료, 필요한 경우 근관치료의 과정까지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한다. 바닥이 더러울 경우 청소도 한다. 하지만 메
- 조영갑 기자
- 2016-02-15 10:05
-
술에 지친 간 커피로 지킨다
커피의 효능은 어디까지인가. 커피가 과음 등에 의한 간 손상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영국 사우스햄프턴 대학 의과대학 연구진은 이와 관련된 연구논문을 종합 분석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밝혀냈다고 데일리메일 인터넷판이 최근 보도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커피를 매일 2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간경변 위험이 44%, 간경변으로 사망할 위험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9건의 연구논문에서는 총 43만2133명의 성인남녀가 조사대상이 됐고, 음주, 간염 등 다른 간경화 위험요인들이 고려됐다.연구팀의 O. J. 케네디 박사는 “커피의 어떤 성분이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커피에 간경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간의 염증 또는 섬유화 과정을 억제하는 다양한 생리활성물질들이 들어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커피에는 1000여 가지의 이상의 성분이 들어있으며 그 중엔 카페인을 포함, 클로로제닌산, 멜라노이드, 카웨올, 카페스톨 같은 항산화, 염증억제 성분들이 포함돼 있다.
- 조영갑 기자
- 2016-02-15 10:05
-
4개 그림으로 치매 발병 93% 예측
특별한 공간기억 테스트를 통해 치매 발병 가능성을 2년 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이목이 쏠린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연구팀은 최근 공간기억 테스트의 일종인 ‘4개의 산 검사법(4MT: 'Four Mountains' test)’으로 최장 2년 후 치매 발생 가능성을 93%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데일리메일이 보도했다. 이 테스트는 어떤 산의 풍경을 찍은 영상을 보여준 다음 그 산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3개의 산 영상 중에서 처음 보여준 산과 같은 산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치매로 이행될 가능성이 큰 경도인지장애(MCI: mild cognitive impairment) 노인 1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이 테스트에서 정확한 답을 못 맞힌 사람이 2년 후 치매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치매 검사법은 요추천자(lumbar puncture)를 통해 채취한 뇌척수액 속의 치매 특이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공간기억 테스트가 요추천자 검사만큼 정확하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 조영갑 기자
- 2016-02-15 10:05
-

임신기간 생선 섭취···똑똑한 아이 낳는다
임신 기간 중 생선을 적당량 섭취하면 똑똑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이 쏠린다.일본 도호쿠대학 의과대학의 노리코 오스미 박사 연구팀이 임신 중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는 생선 섭취를 늘리면 태아의 뇌 발달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메디컬뉴스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연구팀이 쥐 실험을 통해 새끼를 밴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엔 오메가-6 지방산이 오메가-3 지방산보다 많은 먹이를, 다른 그룹엔 두 지방산의 비율이 비슷한 먹이를 준 후 태어난 새끼의 뇌를 비교·분석했다.그 결과 두 지방산의 비율이 비슷한 먹이를 먹은 쥐가 낳은 새끼들은 오메가-6 지방산이 훨씬 많은 먹이를 먹은 쥐의 새끼들보다 뇌의 크기가 현저히 컸다.오스미 박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식단은 씨앗에 많이 들어 있는 오메가-6 지방산보다 생선에 많이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이 훨씬 적다”며 “임신 여성이 오메가-3 지방산 섭취를 늘려 두 지방산의 균형을 맞추면 뇌 기능이 향상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정연태 기자
- 2016-02-02 10:47
-

심장박동 느릿느릿···심장병 위험과 무관
단지 심장박동이 느리다고 해서 심장병 위험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이목을 끈다.미국 웨이크 포리스트 메디컬센터 내과전문의 아자이 다로드 박사 연구팀이 심장박동이 너무 느린 서맥(brachycardia)이 심장병 위험 증가와 무관하다는 연구결과를 ‘JAMA Internal Medicine’ 온라인판에 발표했다고 헬스데이뉴스가 최근 보도했다.연구팀은 다민족 동맥경화 연구(Multi-Ethnic Study of Atherosclerosis)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 남녀 6733명(45~84세)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진행한 조사 자료를 분석했다.그 결과 심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서 서맥인 사람의 경우 심박 수가 정상인 사람보다 심장병 위험이 특별히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혈압약인 베타차단제, 칼슘경로차단제 같은 심장박동에 변화를 주는 약물을 복용하면서 서맥인 사람은 심박 수가 정상인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다로드 박사는 “이는 심장박동을 느리게 하는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에게는 서맥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연태 기자
- 2016-02-02 10:47
-

치과진료 ‘전류 마취법’ 나오나
치과치료 시 주사기를 이용해 부분 마취하는 대신 입안에 아주 작은 양의 전류를 흐르게 함으로써 마취를 하는 방법이 새로 개발됐다. 주사바늘에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브라질 상파울로 대학 비엔나 로페즈 교수 연구팀이 이 같은 연구결과를 ‘Colloids and Surfaces B: Biointerfaces’ 저널에 발표했다고 메디컬뉴스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연구팀이 돼지 실험에서 돼지 입안에 PCL(prilocaine hydrochloride)과 LCL(lidocaine hydrochloride) 물질을 묻히고 전류를 흐르게 한 결과, 주사기를 이용해 국소 마취할 때보다 마취가 더 빨리 되고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이온토포레시스’(iontophoresis) 과정이 마취제가 입안에 더 잘 침투할 수 있도록 돕게 했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팀 설명이다. 로페즈 교수는 “치과 치료 시 이 방법을 이용해 마취할 경우 환자들의 진료비 절감은 물론 감염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전 세계 수천만의 치과 환자들이 더욱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이 기
- 정연태 기자
- 2016-02-02 10:47
-

‘감자 먹방’ 임신성 당뇨 초래
임신 전 감자를 자주 먹으면 임신성 당뇨가 나타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미국 국립아동보건·인간개발연구소 연구팀이 ‘영국 의학 저널’ 온라인판에 임신 여성들의 음식섭취가 당뇨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이 같은 결과를 실었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연구팀이 여성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10년에 걸쳐 이들의 식습관과 건강상태를 추적 조사한 결과, 임신 전 매주 2~4컵의 감자를 먹는 여성은 임신성 당뇨 위험이 27%, 일주일에 5컵 이상 먹는 여성은 50%까지 임신성 당뇨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자 섭취량이 많을수록 임신성 당뇨 위험은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 매주 감자 먹는 횟수를 2번으로 줄이고 이를 다른 채소나 통곡류로 대체하면 임신성 당뇨 위험을 9~12% 줄일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 전수환 기자
- 2016-01-19 16:51
-

무치악에 심혈관질환 사망위험 두 배 높다
치아가 없는 심혈관질환 환자의 경우 사망위험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스웨덴 웁살라대학병원 연구팀이 ‘유럽심장예방저널(European Journal of Preventive Cardiology)’ 최신호에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메디컬뉴스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연구팀이 39개국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4년여에 걸쳐 이들의 치아 상실 정도와 이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연구결과 치아 상실률이 높은 사람들은 노인이나 흡연자, 운동량이 적은 사람, 여성 등이었으며, 실험기간 이들 중 1543명이 심각한 심혈관질환 증세를 보였다. 또 301명은 심장발작을 일으켰으며, 705명은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했다.이들은 치아수가 정상인 사람들과 비교해 주요 심혈관질환 증세 발병위험이 27%, 심장발작 위험이 67%,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8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치아상실률이 큰 심혈관질환 환자들의 사망위험은 치아가 모두 있는 심혈관질환 환자들의 두 배 이상이었다. 연구팀은 치아상실의 주된 원인으로 치주질환을 지적하며, 이번 연구결과가 치주질환과 심혈관질환 사이의 연관성 및 그로
- 전수환 기자
- 2016-01-19 16:51
-

‘스트레스 살’은 진실
만성 스트레스가 체중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미국 플로리다 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이 ‘지질 분자·세포생물학지’ 최신호에 만성 스트레스가 지방 연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이 같은 결과를 실었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연구팀이 쥐 실험을 통해 만성 스트레스가 지방 연소에 관여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베타트로핀 생성을 촉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만성 스트레스가 지방을 축적시키거나 지방 대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성 스트레스를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체중 증가를 야기해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양 리준 박사는 “가벼운 스트레스는 단기적 자극을 유발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 전수환 기자
- 2016-01-19 16:51
-
전립선암 사망위험 40% 낮춘다
전립선암 환자가 아스피린을 꾸준히 복용하면 이로 인한 사망 위험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1982년도에 시작된 대규모 연구조사에 참가한 2만2071명의 30년 간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규칙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한 전립선암 환자의 사망위험이 최대 40%까지 줄어들었다고 헬스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그러나 전립선암 환자의 사망 위험을 높이는 효과는 탁월했지만 조기에 전립선암의 유발을 예방하는 효과는 없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일주일에 3번 이상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전립선암 환자는 복용하지 않는 환자에 비해 사망률이 39% 낮았으며, 전립선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돼 치료가 어려운 종양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24% 낮춰 주는 효과가 있었다. 조사기간에 3193명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고 이 중 403명은 암세포가 전이된 진행성 암으로 발전했다. 연구팀의 크리스토퍼 얼라드 박사는 “혈소판의 존재는 혈류 속을 떠도는 암세포를 면역체계가 식별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며 “아스피린이 이런 혈액 속의 혈소판 응집을 막아 혈액 속을 떠도는 암세포를 면역체계가 식별하기 쉽게 만들기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
- 조영갑 기자
- 2016-01-12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