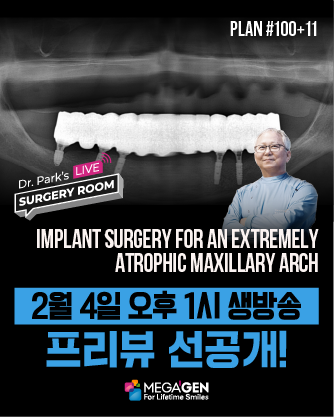“치과의사”라는 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한 종편 방송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해서 대리수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마치 구강악안면외과 의사가 악교정수술을 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처럼 얘기하며, 진행자가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을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악교정수술, 윤곽수술의 전문가라는 의사 패널은 “무면허 진료”라 하더군요. 많은 구강악안면외과 의사들이 분노했고,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악교정수술을 업으로 삼고 있는 구강악안면외과 의사의 감정이 앞서 있었지만, 결국 제 마음을 뾰족하게 만든 한 마디는 “치과의사 가요?” 라는 진행자의 격양된 목소리였습니다.
언젠가부터 치과의사는 여러 미디어에서 얕은 캐릭터를 도맡았습니다. 주말 드라마에서는 바람둥이로, 영화에서는 돈만 밝히는 사기꾼으로 등장합니다. 제가 좋아했던 미드 그레이 아나토미에서는 외과 의사를 꿈꾸는 수련의 크리스티나(샌드라 오 役)가 자신의 아버지가 치과의사임을 밝히는 것을 창피해 합니다. 치과의사를 보는 시선은 동서양이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가 봅니다. 현재의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미디어에서 의도하고 창조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숨기고 싶어 하는 모습을 미디어에서 찾아낸 걸까요?
뒤늦게 이 직업에 대한 성찰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직업에는 명과 암이, 장과 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치과의사를 몸서리치게 소망하던 고3 수험생 시절에는 좋은 점만 보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풍족하며, 자유로운 직업이라 막연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치의학전문대학원, 수련의, 임상강사 시절에는 눈앞에 보이는 치과의사는 선배님과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환자를 대하는 태도, 치료술기를 보이는 손끝, 흰 가운의 매무새까지 콩깍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울타리 안에만 있었기에, 다른 이들의 눈에 치과의사가 부정적이라면 그들을 부정할 만큼 저는 맹목적인 치과의사 편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콩깍지가 벗겨지기 시작한 것은 개원가에서 일하게 되면서 입니다. 환자의 치료계획에 병원운영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한된 물자와 인력 내에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보다 상위의 가치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유롭기 위해서 포기를 배워야 만족할 수 있다는 것도 최근에 수확한 지혜 입니다. 아직 멀었지만 이 일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2010년도 국내 연구를 인용해보면, 환자들의 인식은 공익추구, 사회봉사, 직업윤리 등의 도덕적 측면 뿐 아니라, 전문 직업성 측면에서도 치과의사를 낮게 평가합니다. 분명 우리는 세계 치의학을 선도하는 뛰어난 임상가이자, 과학자라고 자부하지만, 국민들과 환자들의 인식은 결을 달리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요?
우리가 각자의 울타리를 너무 높게 쌓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치과 내 분과에서는 각자의 이해가 다르다는 핑계로, 개원가에서는 당장 이번 달 수익이라는 핑계로 치과 커뮤니티 전체의 현안에 대해 관심을 접어두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번 종편 방송이 구강악안면외과, 악안면성형재건외과, 양악수술학회 만의 문제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들은 치과의사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대로 “유사 의료인”의 이미지로 남아있어야 하나요? 종편 방송 진행자의 발언이 구강악안면외과의 진료영역을 잘 모른다는 무지의 소치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치과의사라는 더 큰 범주의 우리가 폄하되는 것 같습니다. 치과의사는 생명을 존중하고,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학술연마와 최선의 진료수준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진료를 함부로 낮춰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치과의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