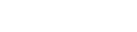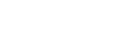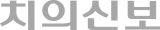2025년 6월 8일,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Tony Awards)에서 뮤지컬 작품상, 극본상, 음악상(작사·작곡상), 연출상, 남우주연상, 무대디자인상 등 주요 부문 6관왕을 석권하며,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습니다. 이 작품은 감성적인 서사와 섬세한 음악으로 미국 평단의 찬사를 받았으며, 단지 한 편의 뮤지컬의 성취를 넘어 K-컬처(K-Culture)의 예술적 깊이와 보편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림 1).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사랑은 아름답지만 유한하다”는 인간적인 진실을 로봇의 이야기로 담담하고 애틋하게 풀어낸 작품이죠. 21세기 후반, 구형 헬퍼봇들이 모여 사는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주인공 올리버와 클레어라는 두 인공지능 로봇이 충전기를 함께 나누며 가까워지고, 결국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그립니다. 그러나 수명이 다해가는 현실 속에서 두 로봇은 서로의 기억을 지우기로 결심하나, 모든 것을 지운 후에도 다시 만나게 되면서 ‘끝이 정해져 있어도 그것이 해피엔딩일 수 있다’는 여운을 남깁니다. 특히 이 작품이 세계적 주목을 받은 데에는 한국적인 정서와 생활문화의 섬세한 반영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죠.
![그림 1. 어쩌면 해피엔딩 [출처: //www.bbc.com/korean/articles/cp85xp3z615o]](http://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0727/art_175142414366_dd6b36.jpg)
사실 최근 10여 년간 한국은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세계적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BTS, BLACKPINK 등 K-pop 아티스트들은 그래미 시상식과 코첼라 무대에 오르며 글로벌 음악 산업을 재편했고, Squid Game, Extraordinary Attorney Woo, The Glory 등의 K-drama는 넷플릭스 시청 순위를 휩쓸며 언어와 국경을 뛰어넘은 공감대를 만들어냈습니다. K-food와 K-beauty 역시 미쉐린 가이드, New York Times, Vogue, Allure 등 주요 매체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전 세계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K-컬처는 단순한 소비재를 넘어 예술, 기술, 가치가 어우러진 복합문화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레이디 가가는 BTS에 대해 “They’re not just a boy band. They are a cultural movement.”라 말했고, 스티븐 스필버그는 한국 영화에 대해 “Korean cinema captures emotional truth in a way Hollywood sometimes forgets.”라고 언급했었죠.
K-컬처가 이처럼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에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인간의 감정, 관계, 갈등과 같은 전 세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를 섬세하게 다루되, 그 안에 한국 사회 특유의 정서와 미학, 공동체 문화, 기술과 예술의 융합 같은 고유한 정체성을 녹여냅니다. 여기에 빠른 디지털 전환, 탄탄한 교육 기반에서 비롯된 창의력, 그리고 집단 창작 시스템을 통한 정교한 완성도가 더해져, 한국 콘텐츠는 단순한 문화 소비재를 넘어 세계인의 감정과 삶을 흔드는 ‘문화 언어’로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K-컬처는 단순히 ‘한국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을 통해 재해석된 ‘인간적인 것’을 세계 무대에 효과적으로 전달해온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한국의 과학기술과 생명과학 분야 역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내며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AI, 로보틱스 등 첨단 산업에서 한국은 기술력과 응용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정밀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미국과 유럽 주요 기관과의 협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죠. 이러한 과학기술 기반 위에서 한국의 치의학, 즉 ‘K-Dentistry’ 역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은 치과 치료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술 기술, 3D 프린팅 및 CAD/CAM을 활용한 보철 제작, 레이저 및 디지털 스캐너를 이용한 진단 시스템 등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고품질의 치과 재료 또한 국내 개발을 통해 해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교육 측면에서도 한국의 치의학 교육은 정형화된 실기 중심 훈련과 윤리 교육, 정밀 임상기록 활용 등으로 체계성과 실용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및 중동 지역뿐 아니라 미국, 유럽의 치의학 교육기관과의 교류도 증가하고 있죠. 이미 세계 치의학 학술지에는 한국 연구자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국제 학회에서 한국의 술기나 치료 프로토콜은 신속하나 정교하며 디지털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K-Dentistry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을 다듬고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진료 현장의 기술과 연구 성과가 산업화 및 정책으로 연결되는 구조적 통로가 아직 제한적이며, 국가 차원의 중장기 R&D 투자와 글로벌 진출 전략이 보다 정교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와 전신질환과의 연계를 고려한 통합적 치의학 관점이 더 강화되어야 하며, AI 기반 질환 예측 모델, 디지털 임상데이터 플랫폼, 구강 바이오마커 연구 등 정밀치의학으로의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K-Dentistry가 진정한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닌 문화와 윤리, 인간 중심의 의료 철학까지 아우르는 교육 콘텐츠와 국제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K-Dentistry가 보건의료 한류의 다음 물결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확장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