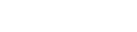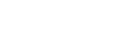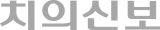<The New York Times>에 오랫동안 연재되고 있는 칼럼으로 “The Ethicist”가 있습니다. 현재 뉴욕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윤리학자 콰매 앤터니 애피아가 맡은 이 칼럼은 독자가 보내는 윤리 관련 질문에 윤리학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치의신보에서 매월 1회 의료윤리 주제로 같은 형식 코너를 운영해 치과계 현안에서부터 치과 의료인이 겪는 고민까지 다뤄보려 합니다.<편집자주>
 김준혁 치과의사·의료윤리학자
김준혁 치과의사·의료윤리학자
약력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 동병원 소아치과 수련.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윤리 및 건강정책 교실 생명윤리 석사.
연세치대 치의학교육학교실 교수
저서 <누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2018),
역서 <의료인문학과 의학 교육>(2018) 등.
환자랑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은 인문학적 지식을 통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치과의사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이를테면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고 왔는데 치료가 문제가 있을 때가 저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특히 치료가 좀 잘못된 것 같은 때 말이죠. 윤리적인 해결책이 있나요?
최근에 갔던 강연 자리에서 받은 질문인데요, 표현을 조금 수정하여 옮겼습니다. 자리에서 짧은 답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지면에도 싣고자 합니다.
질문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지요. 첫째, 나는 환자-치과의사 관계에 적용되는 인문학적 지식을 지니고 있다. 둘째, 나는 다른 치과의사의 치료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지니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긍정한다면, 이에 대해 드릴 수 있는 답은 하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관한 문제이므로, 환자에게 문제 상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을 잘 활용하시어 환자가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대해 환자가 충분히 이해한 상황에서 재치료 결정을 하든, 이전 치과에 가서 다시 문제로 삼든 그것은 환자의 결정 사항이지요. 단, 환자에 대한 설명이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치과의사 동의 없이 녹음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두 전제에 대해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첫째, 인문학적 지식이 그렇게 단순한 것도, 쉬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과의 세계에 오래 살아온 우리 치과의사(의사도 마찬가지로)는 문과적 지식은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제대로 배운 적도,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거나 그를 통해 무엇을 해본 적도 없지요.
저는 여전히 철학으로 박사 과정을 시작했을 때 접했던 막막함을 기억합니다. 나름 책도 많이 읽었고 ‘인문학은 알지’라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철학적 논의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제가 어떤 주장을 세우고 다른 견해와 맞세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논증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것도 여러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지요. 배운 적도, 해 본 적도 없는 학생들에게 논증이 이런 거니까 한번 해봐, 라고 과제를 내주어 봐야 학생들의 혼란만 가중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오랫동안 문과만 했던 누군가가 과학책을 어느 정도 읽은 다음, “그럼, 나 과학 잘 알지”라고 말하는 상황이 얼마나 어색한 건지 말이죠. 물론, 현대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기초적인 사항들은 이해했을 거예요. 예컨대 그 사람은 빛이 입자와 파장의 속성을 동시에 지니며, 그 속도는 불변하고, 그리하여 관성에 기초해 특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이제 물리학자가 되었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리학자가 아닌 사람이 물리학 실험이나 이론에 대해 이렇다저렇다 말하는 것(예컨대, “아, 그런 실험 결과를 우리 생활에 적용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반대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문학을 모릅니다. 인간에 대한 학문을 우리는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그에 기초해 치의학과 치과 의료를 어떻게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먼저 대답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의료윤리학자라고 말하고 있는 저도 인문학을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둘째, 다른 치과의사의 치료를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의과의 진료 과실 판단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일이 있습니다(제가 직접 참여할 분야는 아니니까요). 아시는 것처럼 의료 과오 관련 재판이 있을 때, 재판부는 전문가 감정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보통 대학교수)나 유관 단체(보통 해당 분과 학회)가 감정서를 작성합니다. 그 감정서는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고 양형을 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감정서의 내용에 따라 의사가 벌금을 내고 형을 살지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료가 명확히 잘못되었다는 (또는, 잘못되지 않았다는) 근거가 필요하겠지요. 그 기준은 현재 임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치료에 준하므로, 다른 의사들이 통상 하는 치료를 했는지, 빼놓거나 잘못한 것은 없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세우는 것도, 그런 기준으로 치료가 잘 됐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요.
물론, 명확히 잘못인 치료들, 누가 봐도 문제인 사례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 범주 바깥의 많은 치료는 애매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경우들이 많지요. 게다가, “이런 치료는 조금 그렇지”라고 생각하신 치료들, 예를 들어 치료 계획을 너무 과감하게 세웠다거나, 경제적 동기로 인해 이렇게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치료들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댈 수 있을까요. “다른 치과의사들이 다 과잉 진료를 한다”라던 모 치과의사의 주장이 그의 주관적인 판단과 시류에 편승한 여론 형성 및 일말의 영웅주의에 기대었듯, “이 치료는 조금 문제야”라는 판단도 생각보다 주관의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치과의사가 보면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요.
그런 범위의 치료 결과에 대해 우리가 과실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쉽게, 법정에 가서 자신 있게 “그 치료는 명백히 의료 과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리하면, 주신 질문이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의료윤리라는 분야가 상대하고 있는 진창에 이미 들어오신 거라고 말씀드려도 좋겠지요.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논의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맺음을 대신할까 합니다.
▶▶▶선생님이 진료하시거나 치과의사로 생활하시면서 가지셨던 윤리와 관련한 질문을 기다립니다.
dentalethicist@gmail.com으로 보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