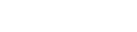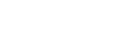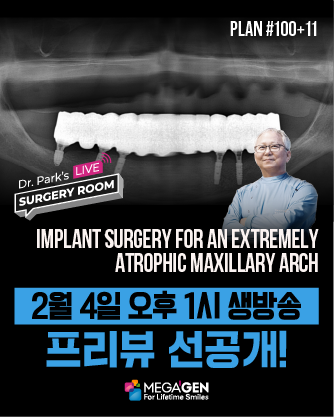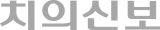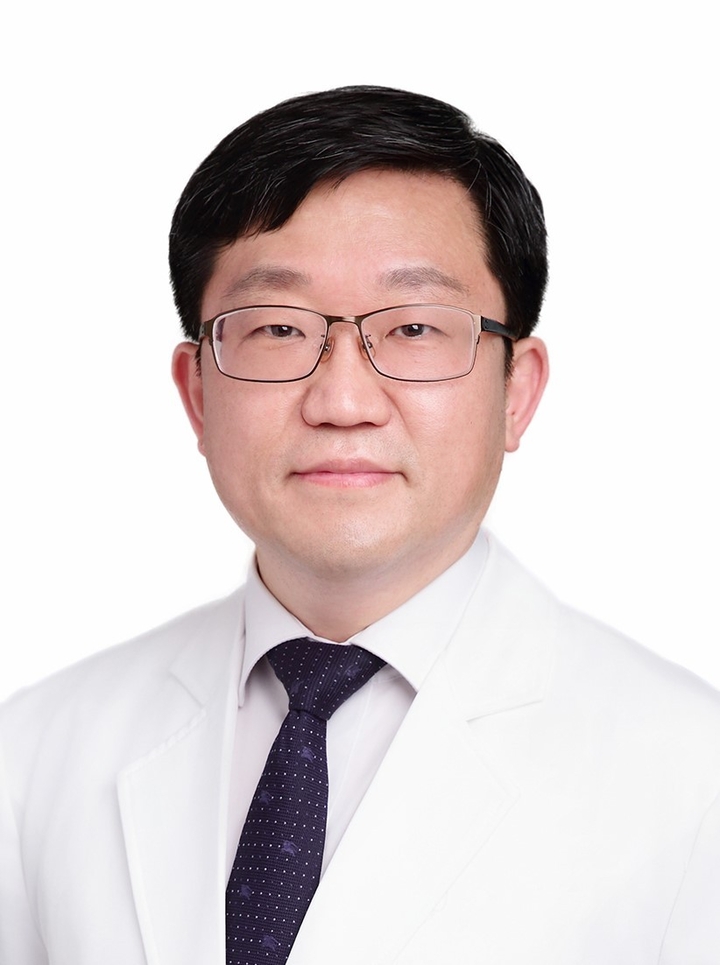
첨단 시설이 갖추어진 병원에서는 의료의 오류가 생길 리 없으며 의사의 숙련도가 더해지면 치료 결과에 결코 실패가 없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사고는 완벽해야 할 의료 행위에 완벽하지 않은 의사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의사도 인간이므로 의료 행위 도중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 부작용이 생기지 않았거나, 이와 반대로 명백한 오류가 없었다 해도 부작용이 초래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항생제 전 투약을 하지 않고 발치했으나 술후 심내막염이 생기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임플란트를 잘 식립하였으나 골유합에 실패한 경우도 있다. 우리가 자주 마주치는 수술 후유증이나 의료 사고는 이 두 가지 사이 어딘가에 있다.
여성 환자가 하악전돌증으로 어느 병원에서 통상적인 악교정 수술(하악지 시상골절단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한쪽의 입술 감각이 좀 더 둔하였고,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점차 돌아오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입술 감각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다. 환자가 인터넷에 검색하여 보니 그것이 하치조 신경 손상이라는 것으로 알게 되었다. 수술 후 1년이 경과한 후,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구강안면통증 검사, 신경감각 검사 등을 받고 삼차신경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그 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부받았고, 곧바로 수술한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비슷한 증례들은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고, 필자도 이와 같은 사건의 신체감정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체계적 문헌고찰에 의하면 악교정 수술 1주일 후에 환자의 약 83%가, 수술 1년이 경과한 후에는 37%의 환자가 감각 이상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olella 2007). 수술의 원리가 하악을 골절 시키는 골절단술이므로 골편을 움직여 맞추는 과정에 골편에 부착된 하치조 신경이 견인되거나 압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수술이다. 따라서 수술 직후 대부분 감각 저하가 있었다가 많은 경우 2~3개월 후에 회복되지만, 환자 10명 중 3명 정도의 환자가 1년이 지나도 어느 정도의 하순 감각 저하가 잔존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이다. 숙련도가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고 하더라도 피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모든 집도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수술 전에 환자에게 상세히 설명한다. 하버드대 구강악안면외과 Kaban 교수와 조지타운대 Posnick 교수는 악교정 수술 후의 감각이상이 “턱 수술의 합병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만 한다”라고 하였다(“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complication but rather a consequence”).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일단 감각이상이 의료분쟁 테이블에 오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비자원, 또는 법원에 대하여 기나긴 대응을 해야 하고, 지난날의 모든 진료행위를 해명해야 하는 험난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까칠한 환자와 보호자들이 한 말이 떠오르고 집도의로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하는 생각이 가슴을 짓누르게 된다.
수술 자체에 잘못이 없었고, 수술 전에 미리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적혀있는 합병증으로 인하여 환자가 불편이나 통증 등을 경험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판례에서는 수술 후 불가피하거나 현재 의학 수준으로는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의 경우에는 의사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또한 설명의무라는 것이 의료행위 과정의 모든 사소한 위험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며, 환자 자기결정권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위험이었는지가 관건이라는 법원 판결도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수술 전에 의사가 설명했다 하더라도 환자가 술후 합병증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면 “설명의무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또한 수술 후 환자의 불편감을 무시하거나, 추가적인 진료나 진료 의뢰에 미흡함이 있었다면 “사후 관리 의무 소홀”로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법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은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경제적·시간적인 손실이 수반되어 자신의 치료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고 세상과 고립된 듯한 우울감이 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니를 발치하거나, 임플란트를 심거나, 악교정 수술을 하거나, 심지어 하악 전달마취과정에서도 하악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 하지만 구강암으로 인하여 신경까지 포함하여 하악을 절제하여 감각을 아예 못 느끼게 된 환자들이 수술 후 감각 소실을 불편해하는 경우가 드물다. 왜 이러한 차이가 있을까?
Beecher(Relationship of significance of wound to pain experienced, JAMA 1956)에 의하면,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은 군인의 32%만이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요구하였으나, 일상생활에서 비슷한 사고를 당한 민간인에게서는 훨씬 더 높은 비율인 83%가 강력한 진통제를 원했다고 한다(박진영의 사회심리학, 동아사이언스 2024/10/12에서 재인용). 신체 상처의 크기나 형태와 실제 느끼는 통증과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환자가 느끼는 고통의 강도는 환자 개인이 그 통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전쟁터에서 죽다가 살아나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과 “평온한 일상에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는 생각의 차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치과의사로서 행하는 대부분의 수술은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환자들은 신경 손상을 죽다 살아난 과정의 불가피한 경험이 아니라 아무 일 없던 일상을 뒤바꾸는 괴로운 사건으로 느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임플란트 식립 후 감각이상이 생겨 의뢰된 많은 중년 여성들이 병원 외래에서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다가 감정에 못 이겨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자주 본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에 앞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나면, 수술 후 초래된 합병증을 받아들여 잘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의료분쟁이 나날이 증가하는 세상에서 수술 전에 예상되는 경과를 세심하게 알려주고, 수술 후에는 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다. 질병이 올라가야 할 산과 같다면, 치료 과정은 환자와 의사가 함께 올라가는 등반 과정이다. 왜 올라야 하는지, 올라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서로가 잘 이해한 다음에 함께 올라가야 한다. 그 과정이 누락되면 등반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