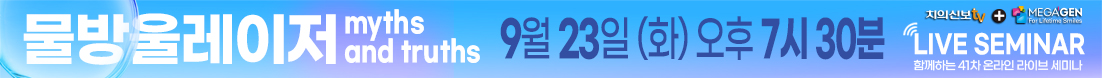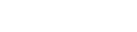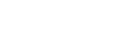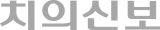환자 82% “임플랜트 비싸도 보장 긴 치과 선택”
“수가 보장과 연계땐 저수가 방지·환자 만족 가능”
보철학회 ‘수가 공정성’ 연구 결과
치의
비용 “200~250만원”·보장기간 “7~10년” 가장 많아
환자
시술 미경험자 100~150만원 “45%”·“평생 보장” 53%
보철물의 보장기간이나 적정 진료비 등에 대해 치과의사와 환자 간의 시각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치과 환자들은 재료비 인상이나 보장기간 연장에 따른 진료비 인상의 경우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장비나 서비스 향상 등의 반영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이재봉·이하 보철학회)가 최근 발표한 ‘임플란트 및 보철수가 공정성에 대한 환자 인식도 조사’(연구책임자 고석민 아주의대 교수, 공동연구자 윤홍철 휴네스 대표)는 치과의사 112명, 스탭 115명, 치과대학생 123명, 치위생과 학생 191명, 환자 362명 등 총 900여명을 대상으로 보철 진료 전반에 대한 각 그룹의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플랜트 1개의 적정비용에 대해 치과의사 그룹의 54.1%는 2백만원~2백50만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 시술을 받은 적이 없는 환자의 경우 45.3%가 1백만원~1백50만원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환자 그룹 중 임플랜트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무경험자에 비해 절반 수준인 28.3%만이 1백만원~1백50만원이라고 답해 시술 유무가 적정수가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그래프 1 참조>.
치료비 납부 시점에 대해서도 치과의사는 치료 전에 50% 이상을 납부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5.8%에 달했지만 환자의 경우 36.1%에 그쳤다.
보장 기간에 대한 인식차도 컸다. 임플랜트의 보장기간이 평생이라고 생각하는 환자는 52.8%로 절반이 넘었다. 치과의사의 경우 3.7%만이 이에 동의했으며 49.1%는 7~10년을 적절한 보장기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그래프 2 참조>.
보장기간 후 재진료 시 환자들은 3.3%만이 치료비용의 100%를 지불해야한다고 응답했고 30~50% 지불이 34.4%, 30%이하가 28.9% 등으로 나타나 향후 보장기간과 관련된 기준 및 원칙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자의 81.7%가 치료비는 비싸도 보장기간이 긴 치과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했지만 치과의사의 경우 60.6%만이 환자들이 이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이 보장기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인 치과의사와 환자 뿐 아니라 직원, 치과대학생 등 각 조사대상 그룹간의 견해가 달랐다. 환자와 의료진 간, 의료진과 직원 간 의사소통 및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 연구자들은 “환자들은 보장에 대한 가치가 성립된다면 적합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응답했다”며 “보장기간의 연장과 적정수가의 보장을 연계한다면 저수가 경쟁으로 인한 치과계의 폐단을 막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도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각 그룹별 공정성 측정 결과 치과의사의 경우 재료비, 인건비, 치료장비, 보장기간 등 모든 요소가 치료비에 반영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환자는 재료비 인상과 보장기간 연장에 따른 치료비 인상에만 공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재 환자들이 진료 중심이 아니라 재료비 중심으로 치과치료비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만약 보철치료의 진료명칭이 전치부 심미성보철 등과 같은 가치 중심의 체계로 전환된다면 재료나 원가 논란에서 벗어나 술자의 시술능력 위주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연구자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