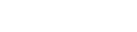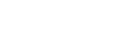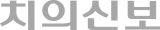'배광식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의 전체기사
-

영고(迎鼓)와 케이팝 데몬 헌터스
1983년 3월에 국립중앙박물관의 박물관회에서 운영하는 박물관대학(박물관 특설강좌)에 7기로 입학했다(올해 48기 입학). 역사학, 인류학, 고고학, 미술사, 사상사, 과학사 등 50여 개 과목을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해 강의를 하는 주 4시간씩 10개월간의 알찬 수업이었다. 한 강사분이 한중일 삼국의 문화특징을 단적으로 이야기 하는데, 한국은 술문화, 중국은 음식문화, 일본은 목욕문화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음주가무가 끊이지 않는 민족이라고 하면서 미구에 세계의 연예계를 이끌 것이라고 예언했다. 40여 년 전 당시의 우리나라 영화계, 가요계, TV 및 라디오 연예 프로그램 등의 상황을 볼 때 ‘과연 그럴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면서도, 그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전거를 보았을 때 ‘일말의 희망을 가져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기원 전후, 우리 조상에 관한 기록은 중국의 사서(史書)를 참조하는 경우가 많고, ‘이십사사(二十四史; 중국 역대 왕조에서 공인된 정사 24권)’ 중 특히 <삼국지 위서 오환선비동이전(三國志 魏書 烏丸鮮卑東夷傳)>이나, <후한서 동이열전(後漢書 東夷列傳)을 많이 참조하게 된다. 삼국지는
- 배광식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
- 2025-09-03 16:08
-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보라! 빛을 향해 열려 있어 그 빛이 동굴 전체에 스며드는, (그러한) 지하 동굴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그곳에 있었고 (두) 다리와 목이 사슬로 묶여 움직이지 못하고 앞만 볼 수 있었다. 그들 뒤에는 멀리서 불이 타오르고 있고, 불과 갇힌 자들 사이에는 (무대처럼) 높이 솟은 길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가공품, 나무와 돌로 만든 사람과 동물의 조각상 및 기타 물품들을 들고 이 (높은) 길을 따라 나타난다. 운반자 중 일부는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다. 동굴 속에 갇힌 자들은 (뒤쪽 멀리에서 타오르는) 불에 의해 동굴 (앞) 벽에 비쳐지는 자신의 그림자나 다른 사람(들이나 물건)들의 그림자만 보고 이 그림자만이 실체(real things)라고 믿는다. (다행스럽게 사슬이 풀려 동굴 밖의 세계에 나가 태양을 보고 온 자가 있는데)... 만약 그가 동굴 밖으로 한 번도 나가지 않은 갇힌 자들과 그림자에 대해 (아는 바를) 말하는 경합에 참가하게 되었고, 아직 그의 시력이 약하고 눈이 빛에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면 — 그가 다른 갇힌 자들에게 조롱당하며, ‘그는 위로 올라갔다가 눈이 망가진 채 돌아온
- 배광식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
- 2025-07-23 14:55
-

ChatGPT 등장 이후의 AI 발전상황과 향후 전망
AI의 발전은 2022년 말 ChatGPT 출현 이후 급격히 가속화되었다. ChatGPT는 자연어 처리(NLP)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오며, 대화형 AI의 새로운 기준을 설정했다. 이 모델은 단순한 대화형 챗봇을 넘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는 대화를 생성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발전은, 출시 후 불과 몇 주 만에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하며, AI 기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고, AI 기술의 상업화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응용을 촉진했다. AI 기술은 이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성,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멀티 모달(Multi-Modal) AI로 발전하고 있다. 인간의 지능이 텍스트를 통해서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오감을 통해서 다양하게 들어오는 모든 정보에 의해 개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AI도 다양한 데이터 활용의 극대화와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공 일반 지능)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멀티 모달이 필요하다. 온디바이스 AI(On-Device AI)는 클라우드 기반의 AI에서 벗어나 개인의 기기에서 직접 작동하는 AI를 의미한다
- 배광식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
- 2025-05-14 14:45
-

파에톤과 마법사의 제자
중학교 1학년 입학 후 자전거 타는 것을 배웠다. 용두동 사대부중 정문 안쪽에 정문에 이르는 넓은 아스팔트 길은 주말에는 거의 다니는 사람이 없어 자전거 배우기에 좋은 곳이었다. 자전거를 잘 타는 친구가 대여점에서 자전거를 빌려왔는데 핸들에 브레이크 조정장치가 없이 페달을 거꾸로 돌리면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자전거였다. 정문 앞 길은 건물 쪽에서 찻길을 향해 어느 정도 내리막길이었다. 자전거를 처음 배워서 어설픈데 내리막에 감당 못할 정도로 가속이 붙으니 페달을 거꾸로 돌릴 여유도 없어 그대로 번잡한 찻길로 달려 나갈 판이라, 핸들을 급히 꺾어 길옆 좁은 숲 쪽에 쳐 박았다. 여기저기 멍들고 까진 것은 물론이다. ‘마법사의 제자(The Sorcerer’s Apprentice, 독 Der Zauberlehrling)’는 1797년에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가 발표한 시로, 마법사와 그의 제자 간의 이야기를 다룬 14연(聯)으로 구성된 발라드 시이다. 이 시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노련한 노마법사가 집을 떠나며 제자에게 집안일을 맡기는데 제자는 물을 긷는 일을 하게 된다. 제자는 마법사가 없는 틈을 타 자신이 배운 마법을 시험해 보
- 배광식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
- 2025-04-02 16:08
-

디지털 시대의 가장 완벽한 문자인 한글
세종대왕(1397~1450)께서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1443 겨울)하셨다. 이듬해(1444.2.20)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崔萬理, ?~1445.10)를 대표로 여러 대신들이 훈민정음에 반대하는 연명상소를 올리며 극렬히 반대하였고, 최만리는 세종의 노여움을 사 의금부에 갇히기도 했다. 이때 세종은 해박한 음운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최만리 등의 무식을 꾸짖기도 하였다. 이는 훈민정음 창제시 집현전 학사들의 도움 없이 세종이 홀로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는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 이후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을 설득하였을 것이고, 권제, 정인지 등이 훈민정음을 사용해 『용비어천가』를 지어 올렸다(1445). 창제 3년 후(1446 음 9월) 『훈민정음 해례본』[정음(御製序文 및 例義)+해례(制字解, 初聲解, 中聲解, 終聲解, 合字解, 用字例 및 鄭麟趾 序文)]을 반포하고, 이와 관계된 일을 처리하는 언문청을 설치했다. 이듬해(1447) 수양대군이 훈민정음을 사용해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설법을 담은 『석보상절』을 편찬했고, 이를 읽고 감명을 받은 부왕 세종은 석가모니의 공덕을 칭송한 노래인 『월인천강지곡』(1449)을 훈민정음
- 배광식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
- 2025-02-12 16:02
-

한글박물관과 증보정음(增補正音)
용산가족공원과 국립중앙박물관과 인접해 국립한글박물관(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이 있다.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의 문자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2014년 10월 9일 문을 열었고, ‘교육공간 조성 및 증축공사’를 위해 1년간(24.10.14~25.10.1) 휴관한다. 휴관 전일인 일요일(10.13)에 하루 종일 박물관 상설전시 <훈민정음, 천년의 문자 계획>과 기획특별전 <사투리는 못참지>를 관람하였다. 상설전시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어제서문(御製序文)의 문장[(1부)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2부) 내 이를 딱하게 여겨/(3부)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4부) 쉽게 익혀/(5부) 사람마다/(6부) 날로 씀에/(7부)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에 따라 7부 일곱 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이제 휴관으로 직접 볼 수는 없으나, 박물관 홈페이지(https://www.hangeul.go.kr/exhi/dailyExhibition.do?curr_menu_cd=0102010000)에 방문하여, ‘온라인 전시(VR) 보기(https://my.matterport.com/show/?m=anBga6EwuVi)’를
- 배광식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
- 2024-10-30 14:08
-

음소(音素)문자 훈민정음(訓民正音)
세계에는 현재 7,164개의 언어가 존재하며, 이중 문자가 존재하는 언어는 250여개였으나, 현재 사용문자는 40여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인간의 언어를 기록하기 위한 시각적인 기호체계인 문자는 말이 갖는 시공상(時空上)의 제약을 극복한다는 특징을 지니며, 단순한 기록 수단을 넘어, 인간의 사고와 문화를 전달하고 보존하는 중요한 도구로, 문자의 발명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 중 하나이다. 문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말의 어떤 단위를 대표하느냐에 따라 흔히 단어문자(單語文字, word writing), 음절문자(音節文字, syllabic writing), 음소문자[音素文字, phonemic writing, 또는 자모문자(字母文字, alphabetic writing)] 등으로 분류된다. 단어문자는 각 글자가 대표하는 단어가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표의문자(表意文字, logographic writing, 뜻글자)이고, 이에 반해 음절문자나 음소문자는 각 글자가 대표하는 단위가 의미 단위가 아니고 소리 단위인 음절이나 음소이기 때문에 표음문자(表音文字, phonographic writing, 소리글자)이다. 단어문자의 최초 모습은 상형문자(象形文字, picto
- 배광식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
- 2024-09-04 15:25
-

인공지능의 위험성(AI Risk)
인공지능(AI)은 빠르게 발전하며 우리 삶의 많은 측면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분야로 AI의 능력 향상에 따라 7단계(The 7 Stages of AI)로 나눌 수 있다. 1)규칙 기반 AI 시스템(Rule-Based Systems, 1950년대-1960년대): 인공지능의 초기 형태로, 결정내리기 위해 미리 프로그램된 일련의 규칙에 의존하며, 복잡한 상황이나 새로운 상황들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음.(예: 의료 진단 시스템, 간단한 챗봇). 2)상황 인식 및 유지 시스템(Context Awareness and Retention Systems, 1960년대-1970년대): 특정영역에 대해 과거 정보를 저장 및 접근할 수 있어, 맥락에 따라 자신의 반응을 조정할 수 있으나, 스스로 학습, 개선할 수 있는 능력 결여됨.(예: 스팸 필터, 초기 체스 게임 프로그램). 3)도메인별 숙달 시스템(Domain-Specific Mastery Systems, 1970년대-1990년대): 게임 플레이나 패턴 인식 같은 특정 영역에서 탁월할 수 있는 AI 시스템으로,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을 사용해 데이터로부터 학습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을 향상
- 배광식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
- 2024-07-10 15:32
-

훈민정음(訓民正音)
한글은 조선의 제4대 임금인 세종이 1443년 음력 12월에 창제해, 1446년 음력 9월 상순에 반포한 우리나라 고유의 문자이고, 한글 창제시의 명칭은 훈민정음(訓民正音;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이다. 훈민정음의 문자 체계를 해설한 한문본 책인 『훈민정음(해례본)』(https://kostma.aks.ac.kr/classic/gojunViewIframe.aspx?dataUCI=G002+CLA+KSM-WO.1446.0000-00000000.0002)은 1446년(세종 28년) 음력 9월 간행된 목판본 1책으로,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과 이 문자의 음가 및 운용법, 그리고 이들에 대한 해설과 용례를 붙인 책이다. 1940년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발견되어 현재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1962년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0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훈민정음(해례본)』의 체재는 크게 ‘예의(例義)’와 ‘해례(解例)’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예의(例義; 예와 뜻)’는 세종의 훈민정음 서문과, 새로 만든 문자 훈민정음의 음가 및 그 운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은 국립국어원(2008) 역에 의하면, “한
- 배광식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
- 2024-05-14 16:22
-

구글의 제미나이(Gemini) 앱
인공지능(AI)은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진 기계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으로, 70년의 역사가 있고, 크게 4번의 주요 흐름을 거쳤다. 1)초기 연구(1950년대-1970년대).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고, 앨런 튜링의 튜링 테스트를 통해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제시했고, 논리적 추론에 기반한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이 개발되었으며, 게임 플레이, 자연어 처리, 증명 등 특정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일반적인 지능을 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2)침체기(1970년대-1980년대). 초기 AI 연구의 한계와 높은 기대에 대한 실망으로 AI 연구에 대한 투자가 감소했으며, AI 연구는 전문가 시스템, 퍼지 논리, 신경망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되었고, 컴퓨팅 성능 향상과 알고리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지능을 구현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다. 3)부활(1990년대-2010년대). 딥러닝 기술 발전과 컴퓨팅 성능 향상으로 AI 연구가 재활기를 띠었고,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기계 번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딥러닝 기반 AI 모델이 성공을 거두고, 빅데이터 등장으로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 배광식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
- 2024-03-20 16:37
-

AI 시대
2007년 1월 9일, Apple은 터치 조작 아이팟(Widescreen iPod with touch controls), 혁신적 휴대폰(Revolutionary mobile phone), 획기적 통신기기(Breakthrough Internet communicator)가 결합된 아이폰(iPhone)을 출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앱을 제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적 및 서비스 환경까지 갖추어 명실상부한 스마트폰의 시대를 열었다. 이제는 생성형 AI인 ChatGPT 등도 스마트폰 앱으로 올라 있다. 1970년대, 비싼 값으로 양수양도가 가능한 유선 백색전화(1970.8.31. 이전 승낙, 전국적으로 45만7천2백80대)와 양수양도 안되는 유선 청색전화(1970.9.1. 이후 승낙)가 있었고, 청색전화는 신청 후 가설까지 2~3년을 기다려야 했다. 이로부터 50년, 최초 아이폰 출시 14년 후인 2021년 스마트폰 보유율은 93.4%이고, 일상생활의 필수매체로 자리 잡았다. 젊은이들은 24시간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경우도 꽤 있을 정도이다. 온갖 영화와 드라마 시청, 온갖 예매, 온갖 결제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스마트폰 뱅킹도 한다. 스타벅스 커피점에서는 매장
- 배광식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
- 2024-01-24 15:17
-

태극기(太極旗)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기이다. 태극기의 태극 문양과 4괘는 역경(易經)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역경은 유교의 기본 경전인 사서삼경의 하나로 주역(周易)이라고도 한다. 역이란 말은 변역(變易), 곧 ‘바뀌고 변한다’는 뜻으로, ‘천지만물의 양(陽)과 음(陰)의 기운이 끊임없이 생성변화하는 자연현상의 원리’를 설명하고 풀이한 것이다. 역은 변역 외에 이간(易簡)·불역(不易)의 뜻도 내포한다. 이간이란 ‘자연현상이 끊임없이 변하나 그 변화가 간단하고 평이하다’는 뜻이며, 불역이란 ‘모든 것은 변하나 일정한 항구불변(恒久不變)의 법칙을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법칙 그 자체는 변치 않는다’는 뜻이다. “역(易)에 태극이 있는데, 이것이 양의(兩儀)를 낳고, 양의는 사상(四象)을 낳고, 사상은 팔괘를 낳는다.(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팔괘가 이루어지니 상(象)이 그 안에 있고, 인(因)하여 거듭함에 효(爻)가 그 안에 있다.(八卦成列, 象在其中矣, 因而重之, 爻在其中矣)” 여기에서 양의(兩儀)는 음(陰:⚋)과 양(陽:⚊)을 말하고, 사상[四象;태양(太陽⚌), 소음(少陰⚍), 소양(少陽⚎), 태음(太陰⚏)]은 효를 두 개 포갠 것이다. 단괘(單卦
- 배광식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
- 2023-11-15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