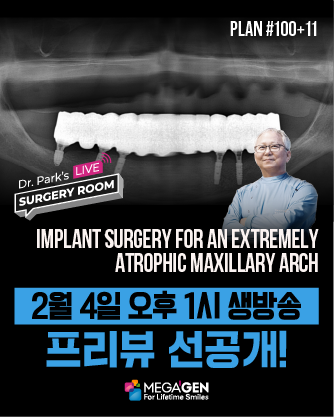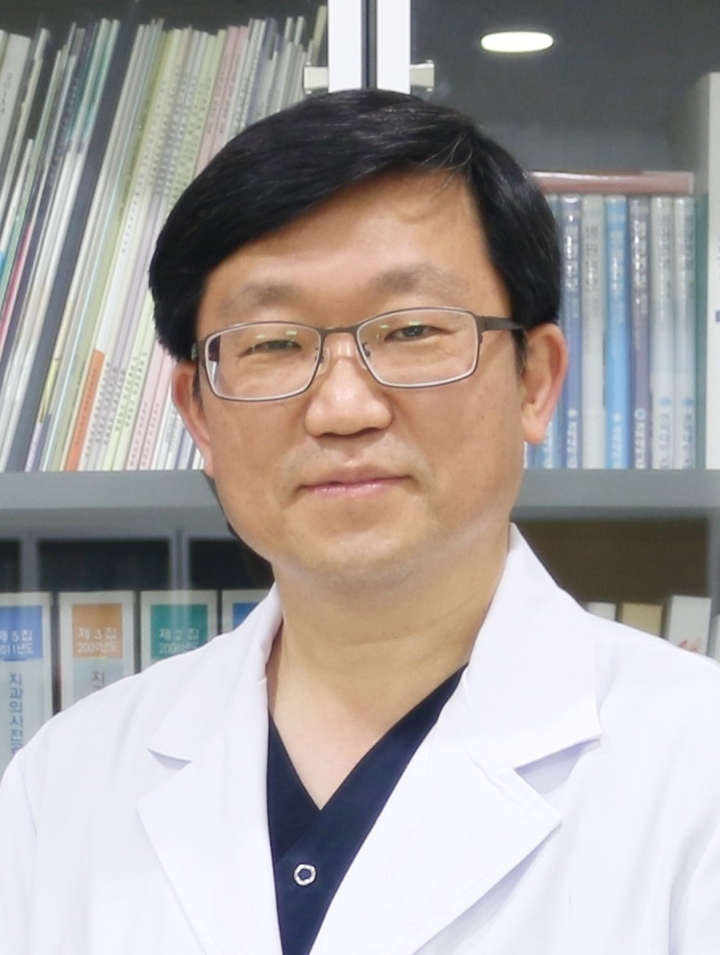
2022년 신학기가 되자 2년 가까이 지속되었던 코로나19가 드디어 2급 감염병으로 바뀌면서 온라인 수업이 전면적인 대면 수업으로 바뀌었다. 수업전날에는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수업에 들어갔는데 뭔가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첫째, 학생들 책상 위에 필기구가 거의 없었다. 볼펜이나 노트 대신 태블릿 PC나 노트북이 있었고, 당연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노트에 필기하는 학생이 없었다.
둘째, 수업 중 내 눈을 마주치는 학생이 드물었다. 대부분 내가 미리 보내준 강의 자료를 각자 책상위의 컴퓨터 화면으로 보고 있었고, 교단 앞의 스크린을 보지 않았다. 수업 전에 미리 보내준 강의 자료와 당일에 보여주는 내용이 달라도, 달라졌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학생들의 반응에 변화가 없었다.
셋째, 막상 학생들을 교실에 모아놓고 대면 수업을 하니, 내가 교실에 있다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이 가상공간에 있는 느낌이었다. 즉 실제 학생들이 아니라 학생 얼굴 영상의 집합체 앞에서 강의하는 것 같았다. 내가 강의실에 있다는 것 빼고는 가상현실에 와있는 것 같았다.
이러한 변화가 낯설어서 대학생 딸아이에게 수업을 어떻게 듣는지 물어보았다. 딸아이는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보여주며 상세하게 설명해주었다. 학생들 중 한 명만 볼펜 대신 스마트펜으로 태블릿 PC에 필기하면 되고, 나중에 지우고 첨가하기를 반복하여 다 같이 돌려보면 되니 학생들 책상이 깨끗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의 편리함에 덧붙여 학생들은 손안에 스마트폰처럼 수업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늦게 일어나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빨리 감아보기), ‘자신이 원하는 자세’로 (누워서) 들었던 비대면 강의에 익숙해진 것이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일정시간의 몰입이 필요하며, 몰입의 초기단계에서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들을 정리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는 나로서는 그런 방식으로 뭔가를 배운다는 것이 가능할까 의문이다. 이제는 온라인 수업이나 대면 수업이나 언제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스마트폰에 과몰입하나 강의에는 과몰입하지 않는다. 사실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그 내용에 과몰입 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을 넘기며 주의력을 끊임없이 소진할 뿐이다. 이러한 주의력 결핍이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을 느낀다.
수업에 집중을 잘하는 학생들은 온라인에서나 오프라인에서나 상관없이 수업 내용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 하에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될수록 성적의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라는 느낌이 드는 학생과 ‘어떻게 이걸 다 이해했지?’ 라는 느낌이 드는 학생들이 한 교실에 모여있다. 내 공부의 양이 적절한지, 수업의 핵심이 무엇인지 혼자 있으면 확신이 서지않는다. 온라인 수업이 지속되면 집중력이 약하거나 이해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없다. “그거 알아?” 이 한마디가 많은 학생들을 살린다.
코로나19 기간의 교육에서 치대 학생들이 사회성을 경험할 기회를 놓친 것이 또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인간 관계를 맺고, 갈등을 겪다가 화해하고, 역할분담을 하는 등의 모든 과정은 환자와 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소통 능력을 기르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 내가 생각한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은 컴퓨터 화면에서 길러지지 않는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이 수업에 더욱 집중하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수업 중에 학생들의 시선을 머물게 하려고 동영상을 보여주고 토론식 수업을 해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이제 교수들도 집중력이 떨어졌다. 강의 준비하는데 SNS에 “좋아요”도 눌러줘야 하고,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같은 답글을 쓰는 것에도 빠지지 않아야 한다. 교수도, 학생도 이제 모두 가상현실 안에서 너무 바쁘다.
수업의 종말을 늦추는 것은 교수들이 기존의 수업을 더 잘하는 것 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학생들이 수업 중에 스스로 스마트폰을 끄고 자신이 학습을 주도하는 형태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그것은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과 교수가 일대일로 마주보는 진정한 대면 교육에서 완성될 수 있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