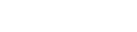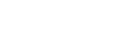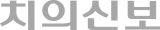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의료, 돌봄, 요양 등의 서비스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사각지대가 있음이 확인돼 우려가 제기된다.
강릉원주치대 외 3개 대학의 치위생(학)과와 경희치대 예방사회치과학교실 연구팀이 최근 10년 이내 보고된 ‘방문 구강관리’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17건을 질적 분석한 결과를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발표했다.
‘돌봄통합지원법 기반의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규정을 위한 질적 내용분석’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발표된 이번 연구는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제15조 제1항 제6호(방문 구강관리)의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로 수행됐다.
연구팀이 선행연구 17건의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수혜자 선별 및 분류를 위한 방법과 기준을 확인한 결과 6가지의 범주(▲장기요양 수급자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고위험군(노쇠 및 허약, 중증질환 환자, 호스피스 환자 등) ▲건강한 65세 이상 지역사회 노인 ▲보건의료 및 돌봄 취약 계층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분류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장기요양 수급자,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자는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사업 수혜자에 해당됐으나, 고위험군, 건강한 65세 이상 지역사회 노인, 보건의료 및 돌봄 취약 계층은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각지대 발생에는 현행 법령에 방문 구강관리의 제공 인력 및 세부 서비스 항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구팀은 17건의 선행연구에서 총 353개의 서비스 항목을 도출했으며, 이 중 ‘구강기능재활운동’, ‘식이지도’, ‘정서지원’ 등은 현재 수행 인력이 법과 제도상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장기적인 노인 의료비 감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 대상자의 구강건강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인력의 활용 방안과 지역사회 자원 및 제도 연계를 통한 국가적 노력이 요구된다”며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혜자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며, 대상자의 나이, 장애, 경제적 수준, 지역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