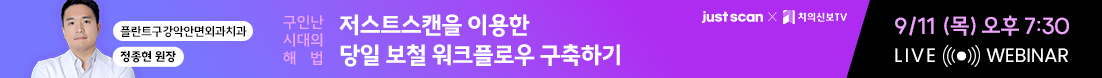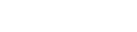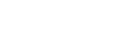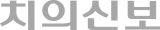한국인의 식습관을 반영한 임플란트 교합조정의 새 기준을 제시한 연구논문이 미국 SCI학술지에 실려 치의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인의 식습관을 반영한 임플란트 교합조정의 새 기준을 제시한 연구논문이 미국 SCI학술지에 실려 치의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는 그동안 임상가에서 통념으로 받아들여지던 Lundgren의 교합 개념이 실제 저작활동에서는 인접 치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 향후 교합조절의 프로토콜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는 허성주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와 박지만 교수(목동이대병원)가 공동 연구한 것으로 ‘교합높이에 따른 임플란트 보철물 교합력 분석에 관한 연구논문’이라는 제목으로 SCI학술지인 미국임플란트학회(AO)공식학회지(JOMI) 9,10월호 ‘Implant science’ 섹션 첫 번째 순서로 실렸다.
논문에 따르면, 그동안 치주인대가 없는 임플란트에서 교합 개념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고, ‘꽉 물 때는 닿지만, 약하게 물 때는 뜨도록 교합조정해야 한다’는 Lundgren 교합 개념이 실제로 한국인의 식습관을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스크류 장치로 교합 높이를 변화시키고, 세 가지 다른 성질의 음식을 저작 시 치아에 전달되는 교합력을 측정, 분석했다. 그 결과 교합이 높을 때 임플란트 자체에만 영향을 미친 당근, 빵 같은 음식과 달리 질긴 육포는 교합을 교합지 두께만큼 낮췄을 때 인접치아에 위해한 하중이 집중됐다.
허성주 교수는 이에 대해 “낮게 조절된 임플란트는 오히려 주변 치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만큼 임플란트 교합조절은 세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만 교수 역시 “질긴 음식을 즐기는 한국인의 식습관에서는 Lundgren 개념은 임플란트 주위 치아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허성주-박지만 공동연구팀은 “실제 임상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임플란트가 사용되고 있으며, 각 임플란트마다 생길 수 있는 변수는 물론 환자의 상황 별로 변수가 많이 존재하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합조절의 프로토콜을 만드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를 정리하는 후속연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