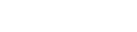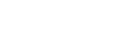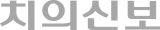'이병태 원장'의 전체기사
-

Chemico-parasitic theory 구강미생물의 아버지 WD Miller의 애틋한 일생
충치 원인설 중 화학세균설(Chemico-parasitic theory)은 불후의 학설이다. 충치설에 관련해서 기술하거나 말할 때에는 밀러, Willoughby Dayton Miller(1853.8.1.~1907.7.12)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WD 밀러’라고 표기 하였다.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할아버지는 농사를 지었다. WD 밀러는 미국 오하이오 알렉산드리아 농촌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13살 때 뉴왁(Newark)으로 이사, 1871년에 중학을 마쳤다. 1875년까지 미시간대학교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하여 BA학위를 받았다. 향학열에 불탄 WD 밀러는 영국 에딘버러대학에 유학하였다. 학자금을 예금했던 은행이 도산하여 1년간 무진한 고생 끝에 독일 베를린대학으로 전학했으나 건강까지 잃고 학업마저 중단했다. WD 밀러는 우연히 미국인 치과의사 트루먼(James Truman)을 알게 되고, 트루먼은 베를린의 미국인 치과개원의 애봇(Frank Abbot)을 소개, 애봇 집에서 일하게 되었다.병원에서는 번역하면서 애봇을 돕고, 집에서는 가정교사로 애봇 부인과 딸에게 영어와 자연과학을 가르쳤다. 드디어 딸과 결혼하면서 치과의사가 되
- 이병태 원장
- 2014-11-04 16:57
-

Amalgam War and Korean Dental War
치의학의 역사를 강의하다 보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집고 넘어가야하는 전쟁들이 있다.그중에서 Amalgam War는 여러 가지로 회자된다.1833년 프랑스 사람 크로카워 형제(Crawcour brother)가 아말감을 미국에 소개하였다. 당시 미국 치과의사들은 와동충전에 금박(gold foil)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아말감은 금박에 비해 값이 저렴하므로 무자격자들과 일부 치과의사들이 아말감을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그러자, 1843년 제2차 미국치과의사회(American Society of Dental Surgeons)에서 아말감충전을 부당치료(malpractice)로 규정하였다. 이로써 협회는 무자격자들의 활동을 견제하면서 회원의 결속을 꾀하였으나 실제는 그렇게 되질 않았다.1845년 회에서는 회원들에게 아말감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거부하는 회원은 제명하였다.결과적으로 회원들은 분열되고 최초로 조직되었던 미국치과의사회는 1856년 해산하게 되었다. 아말감전쟁은, 실제 총칼로 일어난 전쟁이나 국가간 분쟁이 아니라 치과재료학적으로 금과 아말감의 대결로 미국치과계가 파탄났던 사건이다. 금과 아말감의 대결은 치료비의 고가와 저가, 전통-가치관의 보수와
- 이병태 원장
- 2014-10-14 16:26
-
은사 김인철 박사님 영전에
선생님 그립습니다.저희들을 불러 저녁식사를 하시거나, 때로는 저희들이 모시면 “이봐, 자네들도 이제 70이 넘었어.”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많은 사연과 철학을 심어 주셨습니다.서울대 치대(중구 소공동 111)에 입학하시고 개성에서 서울역을 왕복하시던 기차통학, 종로구 소격동에서 자취하시던 일, 8·15광복이 되자 학생회간부였던 선생님께선 우익과 좌익으로 갈린 학생들 사이에 좌익에 대결하셨던 이야기, 개성에서 잠시 개업하셨다가 6·25가 발발하자 ‘빨리 피신하라’는 동기의 말을 듣고 야반도주하여 송악산 자락과 이름 모를 마을을 거쳐 한강을 헤엄쳐 남하하셨던 구사일생의 과거, 군번 없이 미25사단 27연대 75대대 통역관으로 임진강 철교폭파, 관악산전투에도 참전하셨다가 부산피난시절 해군에 입대하시어 치과군의관으로는 최초로 백령도에 근무하셨던 무용담, 퇴역 길에 지고나오는 더블 백에 페니실린을 듬뿍 넣어 주며 환송해주던 미군군의관, 사모님과 만나 결혼하신 이야기, 미아리 단독주택에 사실 때 도둑이 들자 이불 뒤집어쓰고 무저항하시던 스릴 넘친 인생살이…. 선생님께선 주변에 진한 인간미를 남기셨습니다.서울대 치대 교수시절에는 이영옥 교수님의 뒤를 이어 치과보철학을 과학화
- 이병태 원장
- 2014-10-07 11:36
-

사이시옷[ㅅ], 없었으면
수십 년 전이다. 거리의 간판은, 욋과-냇과-칫과 처럼 사이시옷[ㅅ]을 넣어 표시한 적이 있다. 얼마 후에 그 간판들은 슬며시 외과-내과-치과로 다시 쓰게 되었다.사이시옷[ㅅ]사용, 정말 복잡해졌다.갓길-기찻길-노랫말-등굣길-머릿말-뱃살-뱃속-수돗물-이맛살-장밋빛-전봇대-처갓집-치맛바람…. 이런 단어들이 TV 화면 아래 자막으로 홀리듯 지나간다. 그런데 이 단어들에게는 또 다른 발음이 있으니 어찌할 것인가. 그 발음대로 써보면 등교낄-수돈물-장미삣-전보때-치마빠람, 이러하다.필자의 주장은 발음은 어떻게 하던 원 단어는 그대로 하자는 것이다.“여보. 그렇게 할 일 없어? 그까짓 사이시옷인지 사이셧인지, 있으면 어떻구 없으면 어때.”“아니. 넣었다 뺐다가, 최근에 와서 더 많은 단어에 사이시옷[ㅅ]을 넣으니까 문제지요.”사이시옷[ㅅ]을 제대로 쓰자면 다음을 알아야 한다.1. 단어 전체가 한자어(漢字語)이면, 예; 개수(個數), 차수(次數), 초점(焦點)에는 사이시옷[ㅅ]을 넣지 않는다.2. 단어 전체가 한자어(漢字語)라도 예외가 있다. 예; 곳간(庫間, 고간), 셋방(貰房, 세방), 숫자(數字, 수자), 찻간(車間, 차간), 툇간(退間, 툇간), 횟수(回數, 회
- 이병태 원장
- 2014-09-16 14:00
-

맹출과 겸자, 굿모닝 이야기
아기 입안에 이가 보이기 시작하면 엄마들은 놀라면서 뿌듯함에 빠진다. 유치가 빠지면 영구치가 나는 것도 엄마는 보게 된다.아이 입안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tooth eruption은 전문용어로 치아맹출 또는 맹출(萌出)이다. 이 맹출이 1980년대까지 한 동안 붕출(崩出)로 통했다. 이 崩자는 무너진다는 붕괴의 ‘붕’이다. 강의에도 논문에도 붕출이라고 하였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책을 저술하거나 문서를 작성할 때 오늘처럼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하지 않았다. 탈고된 원고에 따라 등사되었다. 그 당시는 줄판 같은 쇠판 위에 원지에다 철필로 원고대로 쓰고, 먹으로 등사해서 교재를 나누어 주던가 시험지를 밀어내곤 하였다. 도표나 그림도 필경공(筆耕工)이 다 했다. 필경공 또는 필경사는 박학다식(博學多識)했다. 분야별로 용어와 한자들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필경사의 지위는 아는 만큼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본다.필경사가 萌자와 崩자를 잘못 베껴 써서였는지, 아예 원고에서 한자 맹(萌)자와 붕(崩)자를 오독했던 것인지, 필자까지도 헤아릴 수는 없는 일이다. 필자가 월간 대한치과의사협회지(협회장 김동순, 김인철) 상임편집위원으로 일할 때이다. 특별기획으로, 바로잡는 고
- 이병태 원장
- 2014-08-12 13:32
-

東洋醫學과 동양구강의학
oriental medicine; 동양의학1. 한국[예; 삼국시대(三國時代)→고려(高麗)→조선(朝鮮)]의 의학을 중국[예; 진(秦)→한(漢)→당(唐)→송(宋)→명(明)→청(淸)]의 중의학과 구별하기 위해 동의학 또는 동양의학이라 하였다. 그 유래는 허준(許浚)의 ‘동의보감(東醫寶鑑) / Donguibogam’(1613)에서 비롯하였으나 실제 사용년대는 수백 년에서 1천년도 넘어 보인다. 약초가 풍부한 지형 지리 조건과 4계(四季)가 뚜렷한 기후 조건의 특성 그리고 중의학, 인도의학, 사라센의학을 도입하거나 그 영향을 받아 독자적인 전통의학을 수립한 의학사상(醫學思想)체계이다. traditioal Koean medicine(TKM)이라고도 한다.2. 영어권에서는 인도, 중국, 티벳, 월남, 한국, 일본 등 지역의 의학을 가리킨다. 이상은 ‘이치의학사전’(2014년)1173쪽에서 전재 한 것이다.‘동의보감(東醫寶鑑)’이후 東醫 또는 東醫學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쓰여 왔다. 최근 북측에서는 ‘동의학사전, 東醫學辭典’(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8년 7월 10일)을 출간하면서도 ‘東醫學’을 사용했다. 그 후 1993년부터 북측에서는 ‘동의학’을 ‘고려의학(高麗醫學)
- 이병태 원장
- 2014-08-05 13:40
-

auto-, self- 없어져야 할 자가(自家)
철학-과학-의학-치의학 분야에 쓰이는 용어에는 여러 가지 접두어(北, 앞붙이)가 있다. 혼동 없이 사용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구석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한다. 동일 사건이나 물체에 관한 용어가 한자어(漢字語)일 경우에, 일본측과 중국측의 한자가 다르면, 고고학이나 고미술, 박물학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중국측 것을 택한다는 견해를 들었다.auto-: 자동적(自動的)·자체적(自體的)·자신적(自身的)·독자적(獨自的)·기동차적(機動車的)·기동차적(機動車的)·자동차적(自動車的)·기차적(汽車的).이상은 한국과 중국 대형 영한(英韓)에서 옮긴 접두어들이다. 어디를 보아도 자가(自家)는 없다. 그런데 일본 일부 표현에 ‘자가(自家)이식’이니 ‘자가(自家)중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조차 일부에서 오늘도 그렇게 따라 쓰고 있다.auto-는 사람이 자기 몸통 자체가 그냥 스스로 해내는 일이나 현상을 가리킨다. 어디까지나 자신면역이거나 자체중합이어야 한다. 또한 기계나 장치에 동력을 걸거나 시동을 주면 이후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자동장치 또는 자동차를 일컫는다.self-: 자기(自己)·자신(自身)·자아(自我)·자주(自主)·자행(自行)·자체(自體)·자동(自動)·스
- 이병태 원장
- 2014-07-22 13:32
-

auto-, self- 없어져야 할 자가(自家)
철학-과학-의학-치의학 분야에 쓰이는 용어에는 여러 가지 접두어(北, 앞붙이)가 있다. 혼동 없이 사용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구석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한다. 동일 사건이나 물체에 관한 용어가 한자어(漢字語)일 경우에, 일본측과 중국측의 한자가 다르면, 고고학이나 고미술, 박물학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중국측 것을 택한다는 견해를 들었다.auto-: 자동적(自動的)·자체적(自體的)·자신적(自身的)·독자적(獨自的)·기동차적(機動車的)·기동차적(機動車的)·자동차적(自動車的)·기차적(汽車的).이상은 한국과 중국 대형 영한(英韓)에서 옮긴 접두어들이다. 어디를 보아도 자가(自家)는 없다. 그런데 일본 일부 표현에 ‘자가(自家)이식’이니 ‘자가(自家)중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조차 일부에서 오늘도 그렇게 따라 쓰고 있다.auto-는 사람이 자기 몸통 자체가 그냥 스스로 해내는 일이나 현상을 가리킨다. 어디까지나 자신면역이거나 자체중합이어야 한다. 또한 기계나 장치에 동력을 걸거나 시동을 주면 이후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자동장치 또는 자동차를 일컫는다.self-: 자기(自己)·자신(自身)·자아(自我)·자주(自主)·자행(自行)·자체(自體)·자동(自動)·스
- 이병태 원장
- 2014-07-15 11:03
-

齒와 牙, 齒는 oral and maxillofacial이고 牙는 occlusion이다
늘 써오던 齒牙를 齒와 牙를 따로 해보니 색다른 느낌이 든다.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齒科라고 하는데 홍콩-대만, 중국에서는 牙科라고 한다. 중국 본토에서 牙科라고 하는 것을 보기는 대한치과의사학회 중국방문행사때 1990년 6월 22일이 처음이다. 한-중국 국교가 성립되기 1년 전이므로 밀입국한 셈인데, 이 행사는 韓中간 현대치의학 교류사의 첫 발판이 되었다. 이 시말(始末)은 ‘北京, 緣邊 그리고 白頭山’(1991년, 초판)에 상세히 기술돼 있다.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회장은 고향 통천을 방문하고 개성공단 설립과 금강산 관광을 성사시키는 시기였다.‘치아’는 치의학도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많이 쓰는 말이다. 치아는 ‘치+아’는 ‘이+이’처럼 중복이 아닌가라고 여겨온 게 사실이다. ‘치’는 무엇이고 ‘아’는 무엇인가.최초에 齒자 모양은 이다. 齒의 위 부분은 코와 눈을 연상할 수 있고, 아래 부분은 벌린 입에 이가 보이는 모습이다. 따라서 齒는 단순히 법랑질-상아질-사기질+치수로 이루어진 ‘이’만이 아니다. 齒는 oral and maxillofacial(구강악안면 口腔顎顔面)이다.牙는 어금니 ‘아’이다.위 아래 어금니가 서로 맞물려 있는 형태를 본떠서 만든 글자이
- 이병태 원장
- 2014-07-08 10:51
-

東洋과 약속시간
안암동에 동양한의과대학이 있었다. 아침이면 대학생들이 우리 집 앞을 지나 학교로 가곤하였다. 이런 이유로 일찍이 東洋과 漢醫學이라는 말을 들었다. 漢醫學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어렸을 적에 주변에서 한약방과 한의사를 보았기 때문이다. 東洋은 우리, 서양은 막연하나마 미국이나 코큰 사람이 사는 서쪽인 줄로만 알았다.치의학의 역사(History of Dentistry)에 관심을 가지면서, 동양과 서양의 경계가 어디이며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관해 이한수(1929~2013) 박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이 박사님은 모태신앙인이며 장로여서 성경과 성경관련 지리에도 해박하셨다.“아마도 동경 70~80도, 인도의 중서부를 수직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해요.” 이 말씀을 역사-문화-인문학 구분을 뜻한다. 지리적으로는 터키 이스탄불로 보기도 한다. 이에 따라 치의학의 역사강의를 하기도 했다. 東洋이란 표현은 송(宋)나라 때 처음 출현했다고 전한다.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하여 동서를 구분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북위 38도라거나 동경 약 127도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만들어진 국제적 약속이고 협약이다. 이에 따라 중국동부-한국-일본은 far east[극동(極
- 이병태 원장
- 2014-06-16 16:16